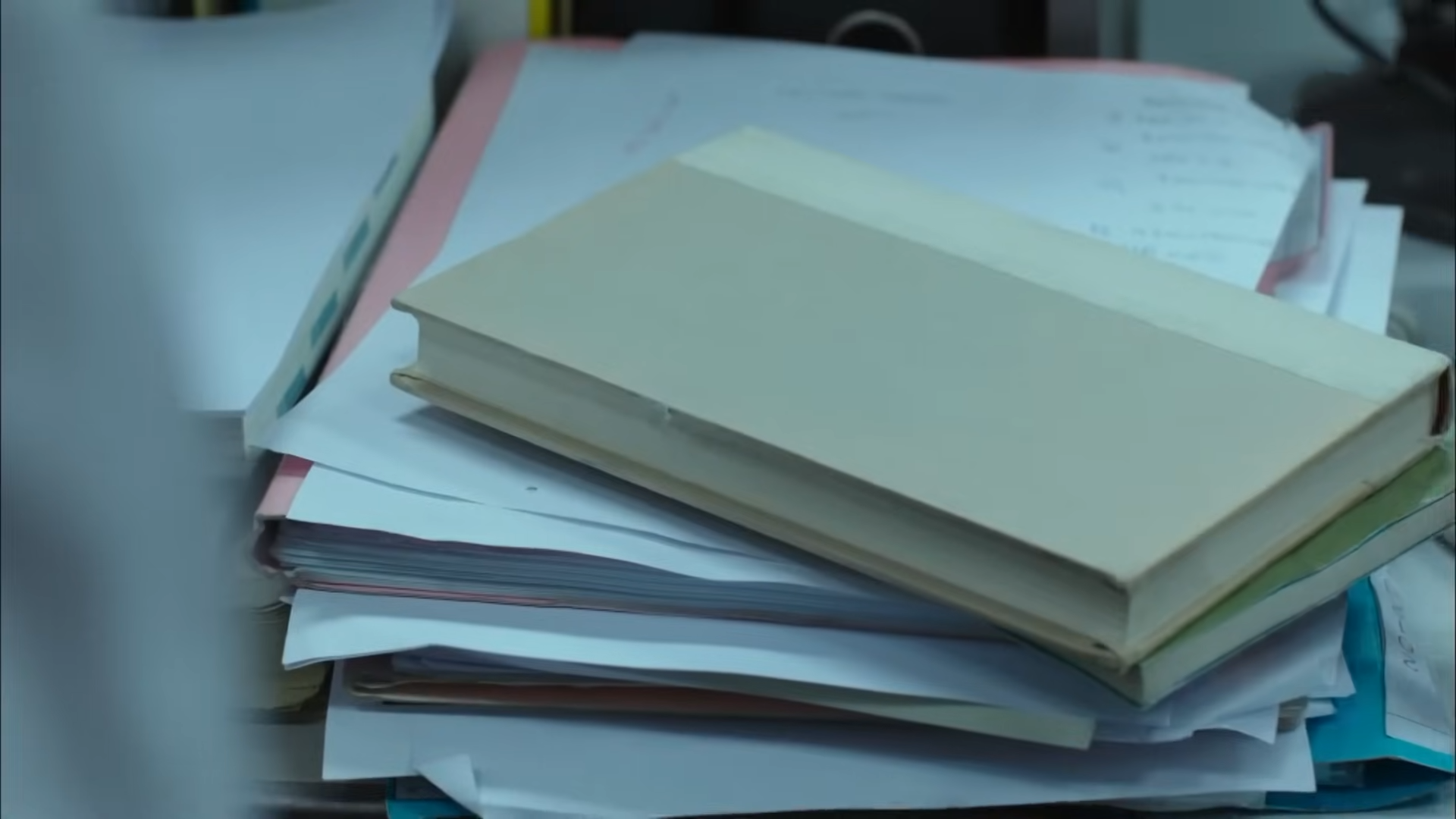
출처 - <미생>
현장(?)에서 다치지 않으려면
첫 출근 일은 한가했다. 그 뒤로도 한 일주일 정도는 교육의 연속이었다.
입사 후 받는 교육이라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연수원이나 교육 전담 부서를 생각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거 없다. 보통 직원 한두 명이 전담하여 대충 이야기하다가 두꺼운 절차서(회사 규칙, 업무 방법에 관한 파일)를 건넨다.
한 시간은 설명을 듣고, 6시간은 받은 파일은 혼자 읽고 또 읽었다. 다른 방에 가서 읽으라고 하면 살짝 졸기도 하면서 읽었을 터인데, 모두 일하는 사무실에 있으니 꼼짝 없이 갇혀 꼼수도 부리지 못한다. 조용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글을 읽으려니 졸음이 밀려와 미칠 노릇이었다.
아직 개인 컴퓨터를 받지 않은 휑한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열나게 두드리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절차서를 읽었다. 사실, 종이에 옮겨 적는 척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날도 다리를 꼬집어가며 절차서를 읽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팀장님 포장하는데 오늘 정웅이도 없고, 사람이 부족한데요?"
"그래? 음… 저기 김지원(필자의 가명) 씨."
"네, 팀장님!"
"가서 최 대리 좀 도와주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출처 - <미생>
나는 최 대리님을 따라 제조 현장에 처음 내려갔다. 현장은 방처럼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고, 구역마다 직원들이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쾅쾅 소음이 심하게 나는 공정도 있었고, 통로에는 소형 지게차가 이동 중이었다. 최 대리님을 따라간 통로 끝에는 커다란 박스가 줄지어 야무지게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밴딩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하는 것 잘 보세요. 여기 오는 끈을 돌려서, 반대쪽에서 오는 끈도 돌려서 구멍을 두 개 만들어서, 여기 흰색 스토퍼로 끼우고 세게 당기면 고정이 돼요."
뭐라는 거야!
"대리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대리는 내가 극존칭을 사용하니 조금은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됐다!"

밴딩 끈에 스토퍼를 채운 모습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너도 써먹을 수 있겠다는 기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끝없이 놓인 박스들을 가리켰다.
"이제 여기 있는 박스들 다 하시면 돼요."
무릎 높이까지 오는 박스에 밴딩 끈을 둘둘 감아서 스토퍼로 포장을 마무리한다. 무릎 높이를 맞추기 위해 연신 쪼그리고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이동한다. 50보쯤 이동하니 다리에 쥐가 난다. 최 대리님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나를 보며 웃었다.
"천천히 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그리고 고용 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우리 회사(중소기업)도 직원들을 앉혀 놓고 위 주제로 교육하고, 사인하고, 노동부 영상도 시청한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강요받는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공장이라는 공간에서 다치지 않으려면 적당히 농땡이 부리며 힘든 일을 요령껏 피하는 방법밖엔 없다.
현장 경험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산업현장 근골격계 사고 예방 영상'보다 '산업현장 어려운 일 피해 가는 방법'이 생존에 훨씬 도움 될 거라 확신한다.
그날은 포장하다 정말 골병이 들었다. 오전 포장, 점심 먹고 포장, 오후에 계속 포장(끝나는 시점에 박스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오리걸음 300보를 왕복하니 아아, 백골 부대 출신인 나도 절뚝거리게 되더라…(이참에 백골부대 인사드립니다. 백골! ... 참고로 현재, 실제 얼굴도 백골이랍니다...)
씨X새X들

출처 - <미생>
마지막 5박스를 남기고 최 대리님과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온다.
팀장과 정태수.
다정하게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 둘은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아니, 정태수가 그 정도로 팀장을 구워삶았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우리 신입사원님 고생이 많네."
"할만해?"
"아니 태수야, 아까 내려가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고 팀장님, 제가 가려는 데 우리 애들이 또 물건 빠진 게 있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하하하"
최 대리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누가 보아도 둘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등장한 놈들이라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하다.
두 사람은 우리가 작업한 박스들을 하나씩 툭툭 치면서, 상태를 체크하는 듯 포장끈을 당겨본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최 대리님이 묻는다.
"담배 태우세요?"
"아뇨, 대리님 피우고 오세요."
"그럼 음료수나 한잔해요."

출처 - <미생>
달그락. 공장 뒤쪽에 있는 흡연 공간에서 포카리스웨트 한 캔을 뽑아서 나에게 건넨다.
"감사합니다."
"어휴, 저 X발X끼들."
헉. 둥글둥글한 최 대리님의 얼굴에서 갑자기 쌍욕이 나오자 흠칫했다.
"어디서 온종일 짱박혀 있다가 우리 포장 다 하니깐 오는 거 봐요."
"... 지원 씨도 저 인간들 조심해요."
하루 같이 작업하고 들은 썰 치고는 너무나 허심탄회하여 조금 놀랐지만, 손 마디가 다 헤져 있는 최 대리님의 손을 보니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간에) 꽤 오랫동안 당한 것 같았다.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오늘 덕분에 잘 끝냈어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지원 씨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고 회사에 소문이 자자해요."
그 후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리님과 친해졌다. 최 대리님은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 현장에서 나를 많이 도와준 형이었다. 회식 때는 술을 잘 못하는 나를 위해 이 친구는 기독교인(실제로는 불교인이기도 하고 천주교인이기도 하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다...)이라면서 내 술잔도 선뜻 비워 주곤 했다.
항상 그래 왔다. 15년의 중소기업 생활 동안, 가끔 보이는 괜찮은 사람, 따뜻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모두 떠나갔다. 친해지고 싶거나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회사에선 그리 오래 버티지 못했다.
... ...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에 아직 남아있는 걸까.

출처 - (링크)
아.
앞의 'X발X끼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 이야기는 천천히 풀어나가자.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 'X발X끼들'중의 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15년을 반복한, 그 말
최 대리님과의 첫 현장 작업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퇴근했다.
"오~ 차 좋은데?"
내 구아방을 보고 놀린다. 대리님은 보라색 코팅이 된 중형 SUV를 끌고 가셨다. 멋쟁이다. 나도 차를 타고 경비실을 나섰다.
300박스 포장 때문인가? 핸들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 친구(지금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원아, 뭐가 그렇게 바쁜데 연락이 안 돼?"
"오늘, 서류 작업하고 회의하느라 많이 바빴어."
그날, 온종일 쭈그려 앉아 박스를 포장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박스를 포장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다. 나는 그런 류의 일을, 아주 어릴 때부터, 묵묵히 잘 해왔다. 그냥 뭔가, 회사 첫 퇴근날,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다.
"오~ 직장인 같은데?"
"월급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오빠!"
"꼭 이럴 때만 오빠라고 하네...!"
여자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자 허전함이 몰려왔다. 쪼그려 앉아 있던 종아리가 아프다. 체력이 고갈되었는지, 긴장이 풀어졌는지, 머리도 아프다.
"그래. 내일도 출근해야지."
엑셀을 밟으며 퇴근길을 재촉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래. 내일도 출근해야지."라는 혼잣말을 앞으로 15년간 하게 될 줄은.
<계속>



![[덴탈MBA] 우리 병원만의 스크립트 만들기](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410/42700_70470_0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