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자 재계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정치가 시장을 흔들 때 리더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성명서의 결은 대체로 같다. '노사 리스크의 불확실성 증대.' 공장 이전, 신규 투자 보류, 국내 법인 축소·폐쇄 검토 같은 단어가 동시에 떠오르며 시장은 흔들린다. 인력 쪽에선 40·50대 권고사직과 채용 동결 소식이 겹치고, 공급망에선 납기·품질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 고객사는 계약을 재검토하고, 리테일·B2B 채널은 대체 공급 옵션을 조용히 찾는다. 이런 국면은 구호만으론 정리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그 비용을 정확히 봐야 한다.
우리의 관찰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탈 한국'은 제스처가 아니라 수요 측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는 선택이다.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제품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같은 규격, 같은 납기, 같은 응대--어제의 약속이 내일도 유효하다는 확인이다.
이때 유용한 렌즈가 어셈블리지(assemblage)다. 들뢰즈, 가타리가 제시하고 마누엘 들란다가 사회이론으로 다듬은 개념으로, 서로 다른 요소가 외부적 관계로 엮여 만든 가변적 묶음을 뜻한다. 공장·사람·계약·데이터·표준·규제를 부품이라 보면, 가치는 부품 자체보다 어떻게 연결 및 조율되느냐에서 생긴다. 묶음은 상황에 따라 분해, 재결합(탈/재영토화)을 거치며 다른 장소로 재배선될 수 있고, 핵심은 부품보다 인터페이스(맞물림 규칙)를 유지·복제하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탈 한국'은 국경을 넘는 부품 교체가 아니라 연결의 재설계다.
기업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공정과 설비, 숙련 인력, 공급계약, 인증·규정, 데이터·문서, 고객과의 약속이 하나의 어셈블리지를 이룬다. 가치가 머무는 곳은 공장 벽이 아니라 이 묶음의 연결부다. 인터페이스가 무너지면 어디서 만들어도 가치가 샌다. 반대로 인터페이스가 유지되면 생산 위치가 바뀌어도 가치의 흐름은 이어진다. 현장에서 결정적인 인터페이스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램프업 커브(초도 90~180일 수율·불량의 맞물림), 품질 핸드셰이크(표준·시험·변경관리의 리듬), 고객 약속의 문장들(OTIF·보증·대체 정책), 암묵지의 조작화(베테랑의 판단을 다른 현장에서도 재현하게 하는 규칙화된 지식). 이 네 축이 붙들려야 연속성이 선다.
문제는 이 연결부에 동시에 걸리는 압력이다. 타이밍 vs 시간--재무의 타이밍과 임직원·고객의 실제 시간표(학기·대출·계약 만기)가 어긋나면 결정이 거칠어진다. 규정 vs 통제감--서류상 준수는 외주로 메워도, 불량을 24시간 안에 잡아내는 현장 통제감은 대체가 어렵다. 충성 vs 이식성--남아주는 충성과 지식의 이식성은 다르다. 효율 vs 회복력--단기 원가만 최적화하면 램프업 지연과 초기 불량이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리더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떠남' 자체가 아니라, 이 지점에서 새는 가치다.
해법은 두껍지 않아도 된다. 이동을 정했다면 먼저 연속성 설계에 착수하자. 기존 한국 조직을 612개월 한시의 전환 관제 노드로 재편해 수율·변경관리·납기·보증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보드에서 동기화한다. 검사 기준·샘플링·허용차 같은 판단 규칙을 중앙에서 단일 언어로 유지하면 초도 변동성이 줄어든다. 동시에 런치 크루를 꾸린다. 기존 거점의 상위 인력을 소수 정예로 612개월 파견·재파견해 새 공장의 첫 10%를 훈련·복제한다. KPI는 투입이 아니라 결과(수율, DPPM, 변경관리 리드타임, 초기 클레임 해결일수)로 둔다. 마지막으로 앵커 노드를 남긴다. S&OP·수요예측, 규제 문서·시험 기획, 품질 데이터 분석, 파일럿→양산 전환 같은 무형 기능을 기능센터로 상주시켜 네트워크의 리듬과 기억을 보존한다. 새 거점에는 머신-리더블 SOP와 시각검사 학습 데이터를 깔아 인터페이스가 개인기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작동 여부는 세 가지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동 D-Day 대비 지연 일수, 초기 수율/불량(FPY·DPPM), OTIF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이 셋을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권한·조치를 바로 연결하면 램프업 지연과 초기 클레임을 초기에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지표를 늘리는 것보다 끊김 신호에 즉시 대응하는 회로를 갖추는 편이 빠르다.
결국 리로케이션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어셈블리지의 재배선이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준은 단순해진다. 고객의 시간표와 약속을 지키는 인터페이스를 보존·복제했는가. 초도 90일 동안 그 연결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답을 가진 조직일수록, 떠나더라도 잃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손병채 ROC(Reason of creativity) 대표 ryan@reasonofcreativity.com

![[김승주 교수 칼럼] 사이버보안, CEO에서 대통령까지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와 기업의 생존 기술](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8752_197776_3036.jpg)


![반도체 ‘추격자’ 돼버린 삼전, 2027년 대반전 시나리오 있다 [왕좌의 게임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18e993d5-a79b-4bac-a2cc-d6623031906a.jpg)
![[전문가기고] 미래차 전환 시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정부 역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news-p.v1.20250811.472176eccc2a438db6a6a47b3c2e39c1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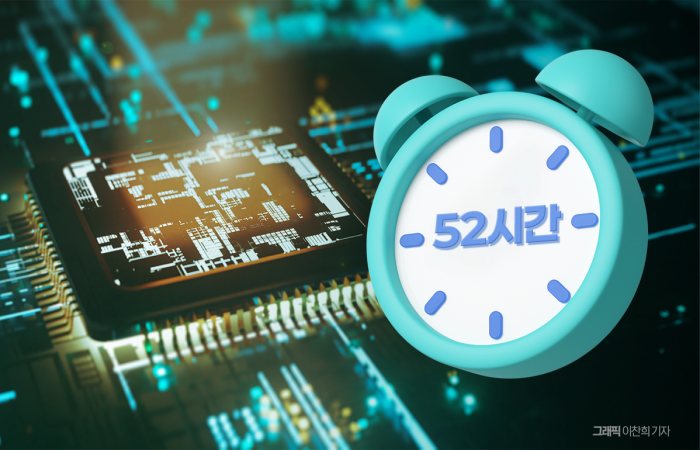
![[SCM FAIR 2025 특집] 니어솔루션, SDW로 물류 혁신 중심에 서다](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3/art_17549957913405_6654f4.jpg?iqs=0.5933500284104486)
![[에듀플러스]“정부 간섭 대신 민간 주도…에듀테크 업계 '자율 생태계' 촉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d6e1be974adb4723ac1e922a24572809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