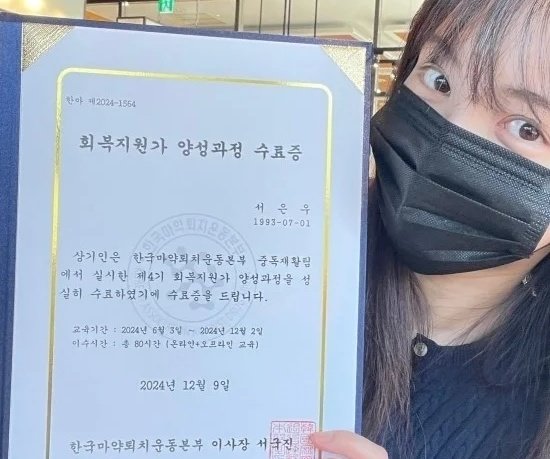남자의 인생 후반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 종사자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종교인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대부분 여성이다. 드문드문 남성이 같은 일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피스라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칸막이 무대는 단연 여성이 독차지하고 있다. 섬세하게 따뜻한 사랑을 환자에게 쏟는 그들에게서 “남자가 불쌍해, 남자가 불쌍해”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색을 하며 내 귀에 꽂아주듯 말을 건넨다. 그만큼 남자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힘들고 험하다는 뜻일 것이다.
70대 남편을 매일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면서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에게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건 분명 모순이죠.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을 거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환자를 돌봐주는 건 힘들지 않아요. 나름의 의미도 있고요. 그럴수록 내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매일 투쟁해요.” 또 다른 호스피스 봉사자가 말했다. “30대인 내 아들도 언젠가는 쓸모없는 늙은 남자 대접을 받을 시기가 오겠지요. 어떻게 저 삶을 이끌어줘야 할지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요.” 나이 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치이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더 잘 안다.

한때 지상파 메인 뉴스 시청률을 1위로 끌어올렸던 유명 앵커 A의 최근 생활을 알게 됐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논평으로 여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반년 전부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말수는 줄고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독거노인이 된 나를 오히려 위로해주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되살아나는 옛정에 가슴이 따뜻해지다가도 금세 쓸쓸해진다. 후줄근한 모습으로 보호센터의 배식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자꾸 그의 전성기 시절과 오버랩된다. 내가 만약 그의 아내라면 남편 얼굴의 눈썹과 코, 귀 주변의 잔털이라도 깔끔하게 손질해주었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에 녹슬었다 해도 고양이 우는 소리라도 내며 “칠칠치 못하게 이게 뭐야” 하고 잔소리를 좀 했을 것이다. 남편의 구겨진 봄철 티셔츠나 바지도 좀 다려 입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보호센터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혹시 스티커(포스트잇) 부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오랫동안 말없이 지낸 부부가 있다.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남편 C는 모든 의사 표시를 오직 스티커에 남겨 놓을 뿐 말문을 열지 않는다. “오늘 저녁 약속 있음. 10시쯤 귀가” 하는 식의 메모를 매일 식탁 위에 붙여 놓는다. 밤중에 남편이 들어와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지 문 여닫는 소리, 샤워장 물소리 등으로 남편의 존재를 인식한다.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 무던하면서 무서운 사람들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아내는 앰뷸런스를 호출하면서 남편을 깨우려 애썼다. 긴급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긴 침묵의 시간이 깨졌다. 하지만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차라리 이혼하지 그래?"
어느 날, 필자가 남편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동안 거리를 둘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남은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편한데”…‘포스트잇 부부’가 택한 인생
최철주의 독거노남 -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