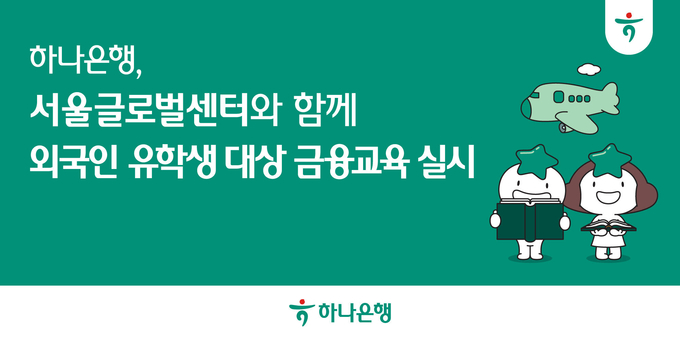“학부를 막 졸업한 학생이 반도체 기업에 입사해 제대로 일하려면 최소 3년 걸립니다. 대학의 가상 팹(공장)에서 공정을 경험하면 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만난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 코리아의 박준홍 대표는 “반도체 산업 현장은 사람은 부족하고 기술 변화는 빠르다”라며 “‘세미버스(반도체와 메타버스의 합성어)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램리서치가 개발한 세미버스 솔루션은 가상 공간에 첨단 반도체 팹을 구현한 디지털 트윈(현실 복제) 플랫폼이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세미버스 솔루션을 ‘지능형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 등 학부 수업에 제공하고 있다. 600개가 넘는 반도체 제조의 모든 공정을 구현한 가상현실에 학생들이 접속해 실시간 3D 그래픽을 통해 체험 학습한다.
이날 박 대표와 함께 만난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기술 발전이 빠른 반도체 분야에 꼭 필요한 교육법”이라며 “대학으로서는 거액인 수백억 원을 들여 팹을 만들어도 몇 년 지나면 구식이 되기 일쑤인데, 세미버스를 통해서 실제 장비로 교육하는 것과 90%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인재 질 높여 인력 부족 해결

한국반도체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에 약 5만여 명 부족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램리서치도 한국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 노력하지만 수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장비보다 판매 단가가 낮음에도, 램리서치가 여기 공들이는 이유다. 박 대표는 “인재의 수를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세미버스는 제조 현장에 활용하려고 만들었지만, 대학 교육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대 입학생이 의대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 하기보다,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강국 꿈꾸는 인도는 2023년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램리서치의 세미버스를 활용해 10년간 반도체 엔지니어 6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인도에 이어 세미버스를 대학 교육에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박 대표는 “수도권 밖 공대생들은 실제 팹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며 “전국에 세미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면, 한국 반도체 인재 전반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커져도, 韓은 중요 시장
램리서치는 1989년 한국 법인 설립 후 국내 공장 3곳, 물류시설 2곳에 이어 연구개발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19%)은 램리서치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2019년까지 한국이 1위(23%)였으나, 중국 시장이 커져 2020년부터는 2위다. 박 대표는 “전체 시장은 중국이 크지만, 한국은 주기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대형 고객사들이 여럿인 데다, 첨단 노드(공정)를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램리서치의 미국 밖 첫 연구개발(R&D) 센터를 한국(경기 용인)에 지었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램리서치는 용인 R&D 센터도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관해서 박 대표는 “한국 기업들이 상무부와 논의 중”이라며 “미국 본사도 워싱턴DC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즈 칼럼] AI 시대, 대학은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4c151754-9d75-48f3-b0e9-3bced6b77069.jpg)




![[ET시론] 시민과학의 원동력, 오스트리아 '스파클링 사이언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7/news-p.v1.20250917.06f4707bbb2d44bf84fcc7c847fd9c64_P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