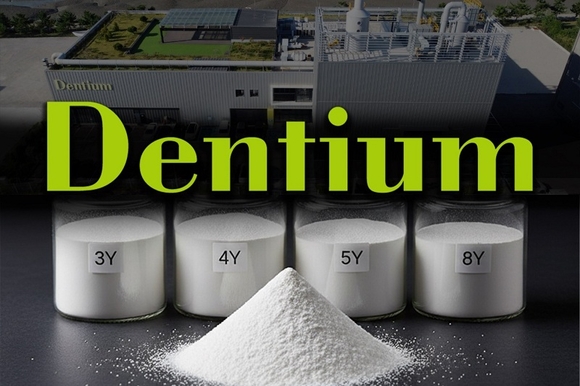자원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광산(urban mining)’ 활용이 시급하다. 도시광산은 버려진 폐배터리나 산업 부산물 등에서 금속 자원을 다시 캐내는 ‘지상의 광산’이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 광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사용된 제품 속에 남아 있는 희소 광물과 금속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산하 자원순환연구센터는 도시광산의 개념을 실제 산업화하기 위한 자원 순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자원 순환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전기차 배터리를 파쇄·분쇄하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인 검은 가루, 즉 ‘블랙매스(Black Mass)’가 만들어진다. 이를 산에 녹여 니켈·코발트·망간 등 금속이온을 용출시키고 용매 추출이나 흡착 기술을 적용하면 금속별로 분리·정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얻은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다시 양극재 원료로 사용돼 새로운 배터리로 재탄생한다. 폐배터리 속 금속은 이미 고순도로 정제된 자원이기 때문에 광석을 새로 처리할 때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탄소 배출량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원 순환 연구 및 기술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술의 재료인 ‘폐배터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실제 사용 후 폐기된 배터리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불량으로 나온 ‘신품 폐기 배터리’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서 회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거 체계가 미비해 상당수가 버려진다. 김홍인 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핵심 광물이 들어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경제성이 낮아 수거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수거량이 너무 적어 재활용 제품을 양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시광산을 활용한 재자원화 시장마저 중국이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저가형 전기차에 사용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대량 확보해 파쇄 및 재활용 공정을 구축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블랙매스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과 경쟁하려면 자동화와 친환경 공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화는 단순히 기계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숙련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해 공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성일하이텍의 경우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인력을 줄이면서도 생산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전략 광물이 다량 함유된 배터리를 단순 폐기하는 대신 회수·재활용해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적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양보다 질’을 강조한다. 폐배터리의 수거·운반·보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7~10년 후 본격적으로 폐전기차가 나오면 그 안의 금속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재활용 원료는 원광석보다 탄소 배출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재활용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