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

![[북스&]정치인의 레토릭·현란한 광고가 가린 진실](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9S3U6P_1.jpg)
![[속보] 李대통령 "노동존중 사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427419321.jpg)
![[기고] 자성(自省) 좀 함이 어떨까?](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1/.cache/512/20250811580294.jpg)

![[전문가 칼럼] 군자는 위로 큰 뜻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욕심에 통달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9753771208_466c27.png)
![[아무도 몰랐던 과거 생물 이야기(48))] 리무사우루스](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904/p1065623266007249_739_thu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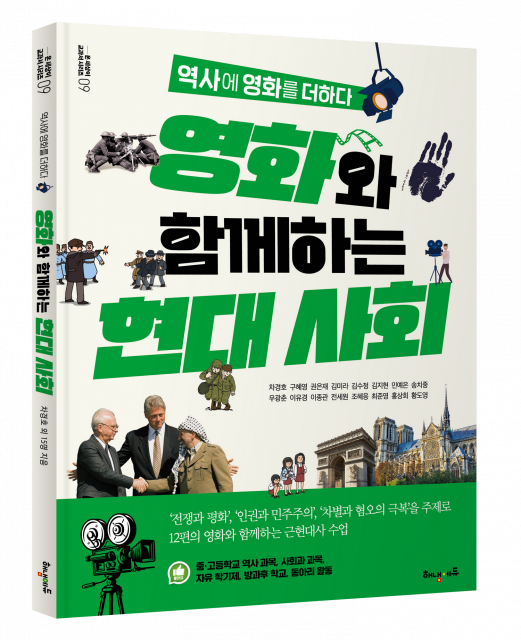
![[금요칼럼]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04/.cache/512/20250904580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