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10음절짜리 행 14개(4-4-4-2 구조)가 규칙적 라임(각운)과 함께 움직이는 정형시다. 총 154편 중 빼어난 것을 고르고, 동시대적 사운드를 입혀 새로 번역하면서, 지금-여기의 맥락 속에서 읽는다.

대리석으로 빚었든 도금된 것이든 군주의 기념물이
이 힘 있는 시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순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댄 이 작품들 안에서 더 밝게 빛나겠지
음탕한 세월에 더럽혀진 저 너저분한 돌보다는 말야.
소모적인 전쟁이 조각상들 거꾸러뜨릴 날이 온대도
그 난리 통에 석조공들이 만든 것들 뿌리뽑힐 때도
군신(軍神) 마르스의 칼이나 전쟁의 맹렬한 화염이
그대를 기념하는 이 생생한 기록 사르진 못할 거야.
죽음에, 또 모든 걸 망각 속에 묻는 적대감에 맞서
그대는 전진할 거고 그대 칭송은 끊이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이 다 닳아 없어져 종말의 운명에 이르러도
그 시대 살아갈 이들의 눈에서조차 그댄 보일 거야.
그리하여 그대 다시 일어서게 될 저 심판의 날까지
그댄 살지, 이 시에, 그댈 사랑하는 이들의 눈 속에.
소네트 55(신형철 옮김)
옛날만큼 읽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르트르의 『구토』는 여전히 존재와 예술의 관계를 성찰해 보기 좋은 텍스트다. “핵심은 우연성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정의상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는 뜻이다.”(임호영 옮김) 이렇게 존재엔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는 사실에 ‘구토’를 느끼던 주인공이 소설 말미에 희미하게나마 ‘구원’을 꿈꾸는 건 재즈곡 하나를 들으면서다. 멋진 음악엔 쓸데없는 거라곤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그야말로 필연의 세계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소설을 써볼까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테고, 나는 내 삶을 혐오감 없이 정당화할 수 있으리라. “앙투안 로캉탱이 이 책을 썼어. 카페에서 빈둥대던 빨간 머리 친구지.”
폭력과 대치해 예술이 할 일
혹자는 삐딱해지고 싶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로캉탱이 쓰게 된 책이 『구토』 같은 작품이라면 그는 구원되지 못했을 것이라고(그 소설엔 쓸데없어 보이는 곳이 꽤 많으니까), 다 떠나서 예술의 힘을 찬양하는 예술이란 언제나 민망한 데가 있다고 말이다. 이런 눈으로 보면 셰익스피어의 이 유명한 소네트도 탐탁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가 위대한 필연성의 세계를 이룩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시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시라니, 이런 자기도취적 시는 곤란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를 택한 건 여기에 ‘전쟁(폭력)과 개인’의 대치 구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 구도 속에서 예술의 할 일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개별적·종합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헬렌 벤들러는 이 시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얘길 들려준다. 이 시의 키워드는 ‘살다’(live)이고 4-4-4-2로 이루어진 이 시의 네 파트 모두에 ‘살다’가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첫 4행연에 “오래 살아남을”(outlive)이 있고, 두 번째 4행연에 “생생한 기록”(living record)이 있으며, 마지막 2행연에는 “그댄 살지”(you live)가 있다. 세 번째 4행연에는 없는가? 있다. “망각”(obLIVious) 속에 ‘살다’(LIV)가 숨어 있으니까. 헬렌 벤들러는 이를 두고 “셰익스피어의 기발한 농담들 중 하나”라고 평가하는데, 이쯤 되면 기발한 게 시인인지 연구자인지 헷갈린다.
요컨대 헬렌 벤들러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예술이 한 사람을 기록해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조너선 포스트에 따르면 그 이상이다. 그는 이 시의 9~10행이 “대담하고도 지독히 감동적”이라고 느끼는데, 시의 대상이 된 이가 “생생한 기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며 “전진”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희곡 ‘겨울 이야기’의 결말에서, 자신의 의처증 때문에 왕비를 죽게 한 왕이, 십수 년이 지난 후 왕비의 조각상 앞에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서 있을 때, 그 조각상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그 비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자) 그 놀라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조너선 포스트가 ‘겨울 이야기’의 결말을 떠올린 것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적절하다. 이 시에서도 시인이 대상의 ‘살아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단지 대상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영원할 거라는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그 당위를 초과하는 어떤 비합리적 믿음까지 담겨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포스트가 지적한 “전진”은 물론이고, 13행(“그대 다시 일어서게 될 저 심판의 날”)에 이르면, 그대는 “부활”하고야 말 존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전쟁과 폭력으로 모든 것이 거꾸러지고 뿌리뽑혀도, 그 누군가를 ‘죽지 않게’ 하는, 아니 심지어 ‘살아나게’ 하는 예술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작별하지 않는다’ 주문 같은 말
이 대목에서 나는 한강의 소설을 떠올린다.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흡사 주문(呪文)에 가까운 말들 말이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 제목이 ‘불가능한 작별’이 된 것은 주어 없는 문장을 쓸 수 없는 프랑스어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제목의 힘을 더 생각하게 된다. 한국어 문장은 주어를 비워둘 수 있다. 그 자리에 누구나 설 수 있고 또 서야 한다. 나는, 너는, 우리는 작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그 누군가는 죽지 않고, 전진하며, 마침내 부활한다. 그러니까, 소년이 오는 것이다. 작별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오게 하는 것, 예술은 그런 것이다.

☞신형철=2005년 계간 문학동네에 글을 쓰며 비평활동을 시작했다. 『인생의 역사』 『몰락의 에티카』 등을 썼다. 2022년 가을부터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비교문학 협동과정)에 재직 중이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좋은 시를 찾아서] 배경이 되는 일](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21010006825000404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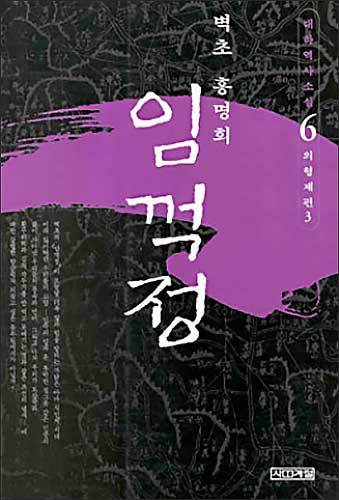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7/art_17321458851565_51ae8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