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앉아서 자기 혼자 즐겁고 재미있게 뭔가를 만드는 아이들이 있었다. 신성희는 바로 이 돌아앉은 아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중간지대의 돌아앉은 아이들 속에서 먼 훗날 꽃이 핀다. 신성희는 그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이한 꽃이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은 서울예고에서 가르쳤던 신성희(1948~2009)에 대해 2010년 이렇게 돌아봤다. 좋은 눈을 가졌기에 잘 그렸던 스승 김창열의 제자 보는 눈이 따뜻하다. 그의 말대로 신성희는 '돌아앉은 화가'였다.

창문이 이지러지며 왜곡되자 누웠던 여자가 놀라 일어난다. 창문은 한층 더 일렁거리며 허상이 되고, 여자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누웠던 자리에 ‘1971 05 신성희’, 화가의 이름만이 흔적처럼 남았다. 벽지에 아크릴로 그린 이 세 폭 회화로 23살 신성희는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1970년 김환기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대상을 받은 그 공모전이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던 해에 내놓은 신성희의 데뷔작 '공심(空心)'이 처음 공개됐다. 서울 삼청로 갤러리현대에서 열리는 ‘신성희: 꾸띠아주, 누아주(Couturage, Nouage)’다. 채색한 캔버스를 일정한 크기의 띠로 재단하고 이를 박음질해 이은 1990년대 ‘꾸띠아주(박음회화)’ 시리즈와 이후의 ‘누아주(엮음회화)’ 시리즈를 중심으로 신성희의 독창적 세계를 재조명한 전시다.

신성희는 1970년대 마대자루에 물감을 한 올 한 올 쌓아올리듯 그리며 화폭의 물성 자체를 강조했다. 그는 극사실주의 회화를 잘 그렸지만 “그건 허상일 뿐 실상을 어떻게 회화로 구현할 지가 나의 목표”라고 했다. 1980년 파리에 건너가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쏟아지던 빛에 매료됐다. 어두운 단색의 극사실주의 화폭에 전구가 탁 켜진 순간이다.

충분히 색을 써서 추상화를 그린 뒤 캔버스 뒷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긋고 가위로 잘라냈다. 잘린 색띠를 엮어 거미줄처럼 만들면 ‘누아주’, 박음질해 솔기가 드러나게 이으면 ‘꾸띠아주’가 됐다. 자르고 엮은 화면에 때론 오래도록 사용해 닳아버린 붓이나 자, 자동차 백미러 거울을 붙인 ‘자화상’도 있다. 이렇게 해서 2차원 평면이던 그림이 3차원의 입체이자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된다. 그러나 ‘돌아앉아 혼자만의 희열을 누렸던’ 신성희는 위로는 단색화, 아래로는 80년대 민중미술과 이후 신세대 작가들 사이에 끼어 덜 조명된 채 잊혀졌다.

파리 개선문에 프랑스 국기의 3색 색띠 조형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했지만 61세, 이른 작고로 미완으로 남았다. 피에르 깜봉 파리 기메박물관 전 수석 큐레이터는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를 찢으며 회화의 죽음을 말했지만, 신성희는 캔버스를 찢으며 그 너머를 보려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에서의 회고전에 이어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중 팔라초 카보초에서 이탈리아에서의 첫 개인전이 마련됐다. 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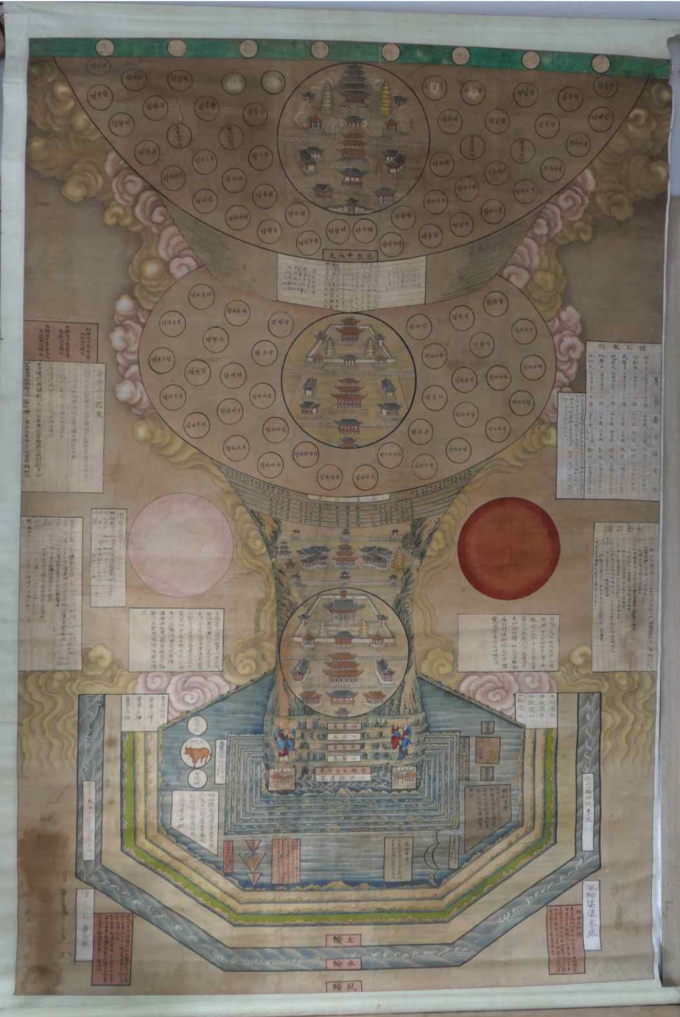


![[전문가 칼럼] 한겨울의 추위가 된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9461341418_1ad935.png)
![[전시 따라잡기] 조동원 작가 개인전…갤러리 오모크 26일까지](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2/20250212010003517000220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