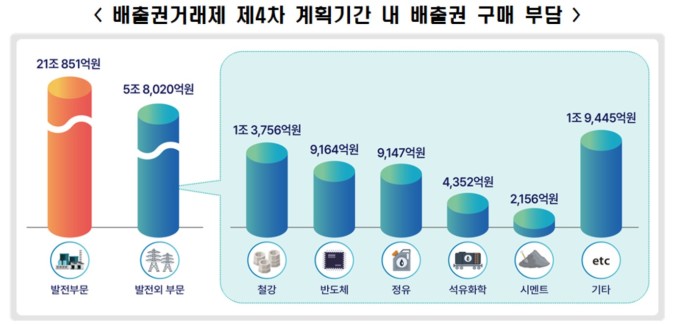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 “민간 업체, 쓰레기 처리 물량 충분”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N4F2V_1.jpg)
![[사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K5Z9JB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