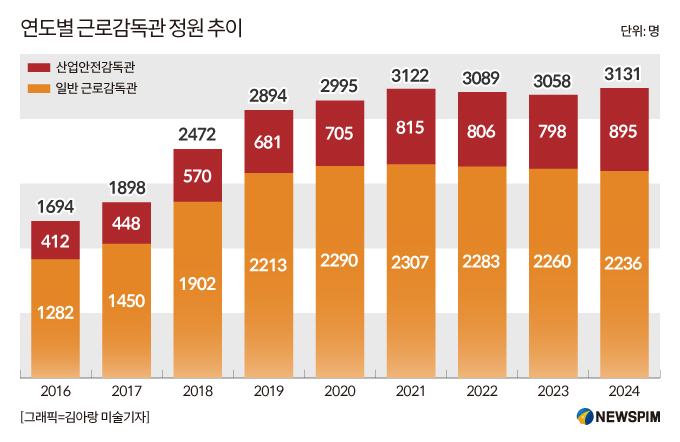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이다. 지자체 사법경찰에 권한을 부여해 산업 현장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작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는 “단순히 인력과 권한만 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이탈”이라며 반발한다. 경영계도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자체의 행정 역량 한계로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보다 14명 늘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해온 산재 감독의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조차 손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그뿐 아니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근로감독을 중앙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만으로는 산재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감독관 증원과 권한 이양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또 다른 채찍’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산업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실질적인 사고 감소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처벌’과 ‘채찍’은 최소한의 억제 수단일 뿐, 안전 문화와 관리 구조의 변화 없이는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