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예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단순한 인내심이나 집요한 야망일까, 아니면 조금은 미친 걸까?" 김오안 감독의 다큐멘터리 '물방울 그리는 아버지'(2021)에는 김 감독이 아버지 고(故) 김창열(1929~2021) 화백에 대해 독백으로 던지는 질문이 나온다. 김 화백의 둘째 아들인 김 감독에게 평생 맑고 투명한 물방울 그리기에 집착한 아버지는 비밀에 싸인 존재였다. 어떻게 한 화가가 50년 동안 줄기차게 물방울을 그릴 수 있을까? 김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다. 이제야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물방울 화가' 김창열 회고전을 지난 22일 개막해 12월 21일까지 연다. 2021년 작가 작고 이후 국공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회고전으로, 미공개 작품 31점을 포함해 총 120여 점을 보여준다. 전시는 특히 물방울 회화가 등장하기 이전인 1950년대 중반부터 김 화백이 파리에 정착한 1970년대 초반까지의 창작 과정을 세밀하게 조명한다. 물방울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가 여기 보인다.
상처의 조형화
평안남도 맹산 태생인 그는 열다섯 살에 홀로 월남해 고향을 떠난 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겪었다. 1948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6.25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 휴전 후 제주도에서 1년 6개월간 경찰전문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격월간지 '경찰신조'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후 김종휘, 장성순, 하인두 등의 화가들과 1957년 한국의 앵포르멜(작가의 즉흥적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추상미술) 미술운동을 주도했다.
주목할 것은 이때 그가 대부분의 작품에 '제사'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점이다. 당시 그가 그린 추상화는 총알 맞은 살갗의 상처, 탱크가 짓밟고 간 흔적 등을 연상케 한다.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6.25 전쟁 중에 중학교 동창 120명 중 60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작가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전쟁의 상흔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상흔'에서 '창자미술'로

전시는 그의 작품이 1965~69년 뉴욕 시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환기의 권유로 뉴욕의 록펠러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해온 예술에 대한 회의와 문화적 단절로 위기를 경험한다. 이때를 가리켜 "전쟁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악몽과 같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 시기에 이전의 두껍고 거친 화면은 사라지고 매끈한 표면의 기하학적 추상이 나타났다. 또 생계를 위해 넥타이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에어 스프레이와 스텐실 기법을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후 69년 파리로 터전을 옮긴 그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는다. 작가 스스로 '창자미술'이라 부른 회화가 등장한 것. 인체의 내장이나 장기를 연상시키는 덩어리에서 점액질이 흘러내리는 듯이 표현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현상' 연작이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이하 학예사)는 "당시 작가는 회화에서 신체성의 문제를 다양하게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
'신체성'이라는 단서가 단순히 그가 쓴 '창자'라는 단어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작가는 1967년에 그린 작품 뒷면에 '플래쉬 앤 스피릿(Flash & Spirit)'이라고 써 놓았다. 번역하면 '살과 정신'이라는 뜻이다. 설 학예사는 "작가의 드로잉과 메모들을 보면 김 화백은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김 화백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을 꼽으며 "내 마음에도 (베이컨과)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 2003년 일기에는 "까마귀가 사람의 시체를 갉아먹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쓰기도 했다. 설 학예사는 "물방울에서 신체성을 연상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신체와 정신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971년 물방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물방울, 우연의 산물 아니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작가가 파리 외곽의 마구간 작업실에서 밤새 캔버스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보고 그린 것이 물방울 회화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김창열의 물방울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조형 실험과 오랜 존재론적 사유 끝에 도달한 결과"임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초기작을 밀도 있게 조명한 결과다.
작가는 1973년 파리에서 연 개인전을 계기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당시 개인전은 프랑스 국민 배우 카트린 드 뇌브와 당시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와서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이후 프랑스의 저명한 평론가 알랭 보스케(1919~1998)의 비평을 통해 명성을 굳혔다. 보스케는 물방울이 불러일으키는 명상적 힘과 존재론적 통찰에 주목했다. 이후 국내외 비평가들의 시선을 통해 물방울은 단순한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동양적 세계관과 연결되며 생성과 소멸, 찰나의 형상, 변화의 상징이자 '덧없음'의 은유로 읽혀왔다.
이번 전시에선 1955년작 '해바라기', 경찰전문학교 잡지 『경찰신조』 표지화 등 초기작이 최초 공개된다. 초현실주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상형시 ‘Il pleut(비가 온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Il pleut(비가 온다)'(1973)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로 공개된다. 설 학예사는 "작가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며 "그에게 물방울은 그려도 그려도 끝내 다 그리지 못한 애도의 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관에서 안이하게 접근했다면 이 회고전은 자칫 지루한 '물방울 바다'가 될 뻔했다. 그러나 전시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시기를 드러내며 작가를 새롭게 마주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 한국 근현대사의 상흔을 예술로 승화한 작가 김창열이 거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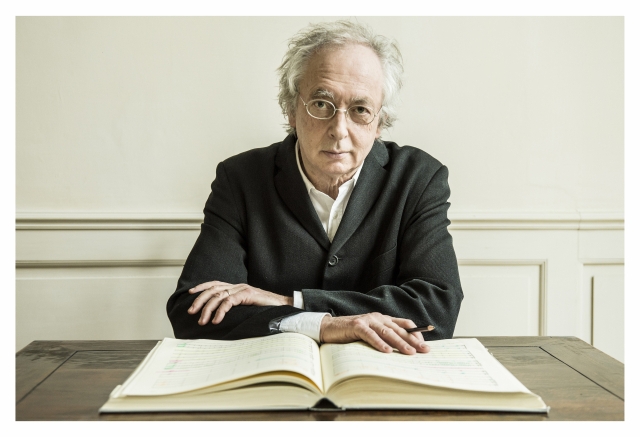


![[오늘의 전시]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초월적 경험은 무엇인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136235111_54ec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