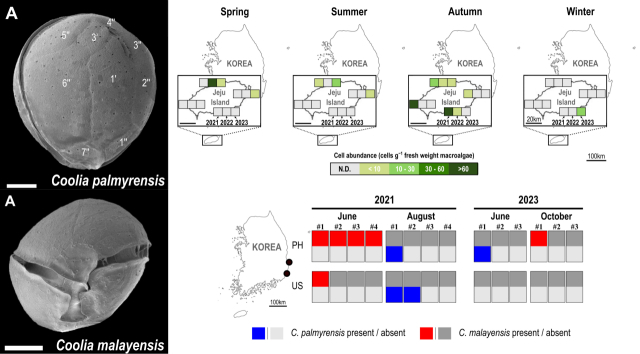얼마 전 농촌진흥청의 슈퍼컴퓨팅센터에 다녀왔다. 슈퍼컴퓨터란 전세계에서 성능이 상위 500위 안에 드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곳 슈퍼컴퓨터는 지난해 6월 기준 399위로, 일반 컴퓨터 1대가 6개월 동안 해석할 정보를 나흘 만에 해치운다.
그런데 여전히 ‘386 컴퓨터’ 수준을 면치 못하는 쪽도 있다. 바로 쌀이다. 제1의 식량작물로 꼽히지만 쌀 관련 정보는 여전히 오차투성이다. 특히 생산량 예측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계청은 매년 10월 쌀 생산량 예상치를, 11월 확정치를 발표한다. 이 결과가 정부 쌀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통계청 발표가 실제와 차이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추정치가 실제 생산량보다 무려 13만t 많았다. 2020년에도 격차가 12만t에 달했다.
원인 중 하나는 일부 지역 필지가 과소·과대 대표되는 탓이다. 표본 조사 시 품종을 확인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품종에 따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달라져서다. 현백률(현미를 백미로 환산한 비율)과 감모율(저장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비율)도 정확도를 깎는 요인이다. 통계청은 생산량 예측 시 현백률 92.9%를 적용한다. 최근엔 90.4%를 적용한 조정치도 발표하고 있는데, 업계는 88%를 사용하는 추세다. 2%포인트 차이는 생산량으로 따지면 10만t에 이른다. 소비량은 또 어떨까. 최근 쌀 소비는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감소세가 가파르다. 코로나19 등 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소비패턴이 출렁이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은 2년 전 소비량을 토대로 예상 소비량을 추정해 오차범위가 크다.
전제가 잘못됐으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쌀 수급 대책이 번번이 빗나가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전 주기 정보·통계를 집약한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인공지능(AI)을 연계해 쌀 수급 예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쌀 정책이 고도화될까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기약이 없다.
쌀 수급 예측시스템이 묘연해진 사이 정부의 쌀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수확기 대책으로 사상 첫 사전 격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쌀값 반등에 희망을 거는 농민이 많지 않아 보인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도화된 쌀 수급 예측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표본을 재설계하고, 계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쌀 통계시스템이 ‘슈퍼컴퓨터’는 못되더라도 386 컴퓨터 수준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지유리 정경부 기자 yuriji@nongmin.com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4/11/10/2DGSG92YK6_4.jpg)
![[취재수첩] ‘농림위성’에 거는 기대](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09/.cache/512/202411095000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