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창피해 혼났네.” 진료실에 들어서는 70대 할아버지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하다. 평소 걷던 길이고 미끄럽지도 않았는데도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했다. “말도 버벅대기 일쑤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매년 이맘때면 낙상이 걱정된다. 자칫 골절이라도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으로 고생할까 두렵다. 일상에서도 몸이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다. 사레가 쉽게 들리고, 음식물도 잘 흘리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이 칼럼을 쓰면서도 평생 다루던 자판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타가 작렬하고, 생각이 글로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서러울 때도 있다.
몸과 마음의 부조화 때문이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 뇌는 빠르게 명령을 내리는데, 몸은 늙어 명령에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근력이 저하됨은 물론이고, 도파민 감소 등 대뇌 생화학적 노화로 인해 운동 반응속도, 미세 운동기술, 그리고 균형감각이 떨어진다. 운전 중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인이 위험 가득한 시한폭탄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속도를 줄이면 된다. 마음에 맞추어 몸을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몸에 맞추어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한다. 여유있게 생각하고, 감정을 오래 느껴보고, 천천히 선택하자. 오히려 신중한 판단은 젊은이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늙으면 느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럽지 않으려면, 당연한 것은 수용해야만 한다.

![[북스&] 잘못 진화한 인간의 몸을 고쳐 쓰려면](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U5KWXF_1.jpg)
![식도암 치료, 까다롭다고? 전문의 총출동…최적 치료법 찾는다[메디컬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TM8PN6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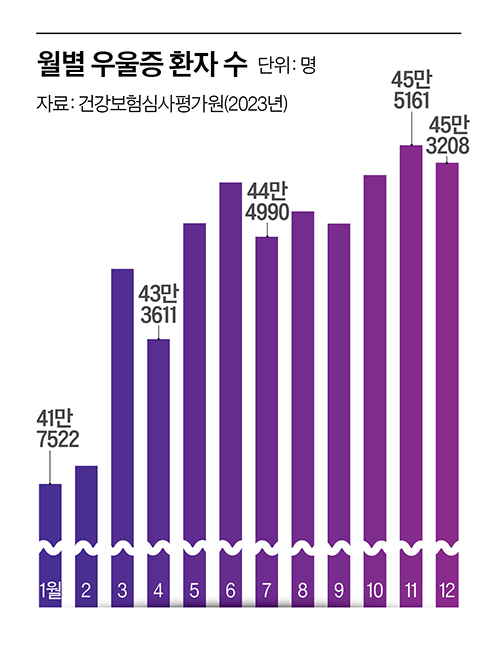
![[데일리 헬스] '먹방 유튜버' 히밥, '이 질환' 걸려 걷지도 못한다..재발 위험도 높아](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120549_1441205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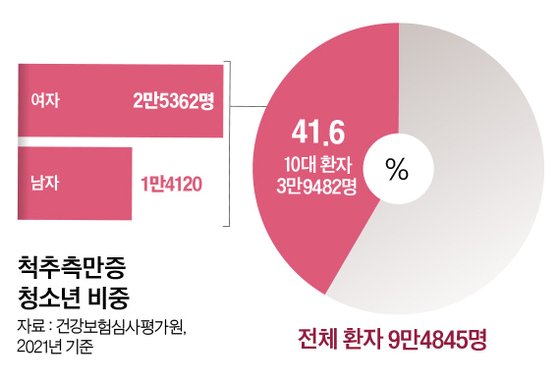

![[독서는 힘이다] 기적의 노트 공부법(1)](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212/p1065601330281501_974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