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나만의 비서처럼 움직이는 '에이전틱(Agentic) AI'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 영역에서도 AI의 활약은 예외가 아니다. AI가 고액 자산가의 금융 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PB)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AI 금융 비서의 등장은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PB 서비스가 이제 모든 고객에게 개방되었음을 의미한다. 내 재산이 얼마이든 AI를 통해 전문적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비서의 성능과 고객의 AI 활용능력에 따라 재테크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재테크의 성공 비결이었다면, 이제 AI 활용능력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지름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AI가 내 돈을 불려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년간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KOSPI) 지수는 9.68% 하락했다. 반면 AI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관텍 국내주식형 대형 3호'는 35.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수치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자문역(Advisor)의 합성어로 AI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투자대상을 분석하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 서비스다. 초기에는 실력 있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전략을 모방해 낮은 운용보수로 펀드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방식이 급격한 시황 변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이 증명됐고, 특히 하락장에서의 냉철한 자산운용은 투자 손실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의 자산 상태와 투자 성향에 맞춘 금융 포트폴리오 운용과 생애주기에 맞춘 재테크 설계까지 지원할 수 있게됐다.
2008년 세계 최초의 로보어드바이저인 베터먼트(Betterment)가 출시된 이래 대형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AI 금융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로보어드바이저 알라딘(Aladdin)을 통해 수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헤지한다.
국내에서도 콴텍, 핀트, 파운트, 에임, 디셈버앤컴퍼니 등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하는 기업들은 뛰어난 성과와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액을 빠르게 불려가고 있다. 이들의 2024년 기준 자산운용액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3483억원에 이른다.
AI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역시 글로벌 금융기관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BoA(Bank of America)는 2008년 자산관리 분야의 강자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를 인수해 2010년 메릴 엣지(Merrill Edge)를 출시한 후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메릴 엣지의 운용자산은 무려 4244억달러에 달한다.
AI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사무엘 리(Samuel Rhee)를 포함한 한국인 7명이 주축이 된 인다우어스(Endowus)가 대표 사례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인다우어스는 AI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싱가포르 유일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모건 스탠리와 HSBC에서 일했던 사무엘 리는 일찌감치 AI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관리가 시대적 흐름임을 깨닫고,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UBS, 노무라증권 등에서 디지털 자산관리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모아 인다우어스를 창업했다. 소프트뱅크, UBS와 삼성벤처투자는 인다우어스의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초기 투자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연금관리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운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당 연 900만원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액이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AI로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의 AI에 대한 투자는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이다. AI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금융권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른 단기실적 지향주의는 AI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I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없이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AI는 더 이상 언론에 내세우는 포장용 업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는 AI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하나로 모인 금융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고객을 위한 제대로 된 AI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제 금융혁신 비즈니스를 꽃피우기 위해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설 때다. 동시에 고객 중심의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AI 투자를 결단할 시기다.
황보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AI 플랫폼 사용자 600만명" 뤼튼, 몸값 3000억 돌파…"고객사 1만 돌파" K뷰티 ODM ‘전성시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8QAZNB_1.jpg)


!["전기차 충전 사업 철수" LG, '선택과 집중' 가속…"숏폼으로 웹툰 뚝딱" 카카오엔터, AI 신기술 공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SUXJTX_1.jpg)

!["20대 AI 개발자도 '억대' 연봉" KT, 급여 상한 폐지…AI 발전에 '일자리 양극화' 경고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9CGKR0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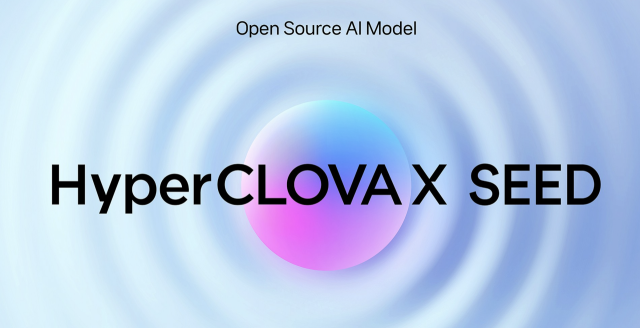

![[단독] 신입도 AI 인재라면 억대 연봉…KT, 개발자 급여 상한 폐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UI6EZN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