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통했다. 배경이나 조건이 부족해도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세대를 초월해 청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곤 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청년들은 이 말을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평등한 구조, 계층 고착,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오늘날 청년들이 '용'이 될 수 있는 토양은 남아 있는가?
현대 사회는 자산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 과열된 사교육 시장, 취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스펙과 비용은 청년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벽이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년이 어린시절부터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네트워크의 수준이 갈린다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아름다운 용어로 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안정된 일자리의 수는 정체되어 있다. 반면 창업이나 도전을 시도하기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재도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은 더 안정적인 길인 공무원 시험, 대기업, 공공기관 입사에 몰리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는 '도전'이 곧 '위험'이 되어버리기 쉽기에 시도조차 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다.
예컨대, 한 지방대 출신 청년 A씨는 학벌이나 배경의 한계를 절감하며 일찍부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갔다.
꾸준한 학습과 시도,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마침내 그 분야의 독보적인 브랜드 컨설턴트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중소기업 대상 마케팅 강연을 다니며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성공 뒤에는 탁월한 전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되는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든다'는 도전정신과 실행력이 있었다.
사회 구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청년개인의 무기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똑똑하고, 빠르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역량을 구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 응용해 활용하는 능력이다.
즉, 필자는 예시로 청년 개개인이 다음의 노력을 병행해보면 어떨까 한다.
첫째는 정보 접근 능력이다. 디지털 시대의 무기는 정보이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읽어내는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연결의 힘이다. 단절된 개인이 아닌, 협업과 연대의 감각으로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 쌓아 나가길 권한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전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멘탈리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선 사회도 함께 변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공정한 기회,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자산 형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청년 개개인은 '기회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에 머물기보다, 작은 틈새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시도할 수 있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무의미한 시대가 아닌, 다시 진실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구조와 개인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사회는 공정한 판을 만들고, 청년은 그 판 위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 개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물고기'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 박이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130명 중 100명이 반수" 몰락하는 '지방 로스쿨'…K뷰티, 글로벌 시장 강자로 부상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A9AVJU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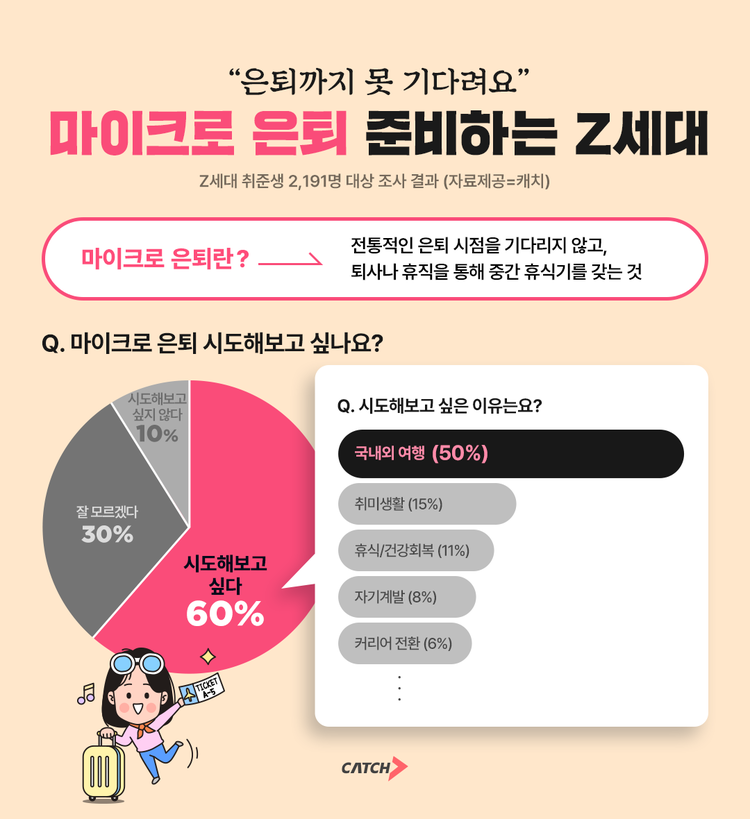
![[속보] 이재명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K이니셔티브 시대 열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4/11/2GRHAC1JUD_2.jpg)
![[MBK 김병주 탐구]② 운명의 순간..."인터뷰 기회 달라" 골드만삭스 회장에 편지](https://img.newspim.com/news/2024/11/04/241104162322290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