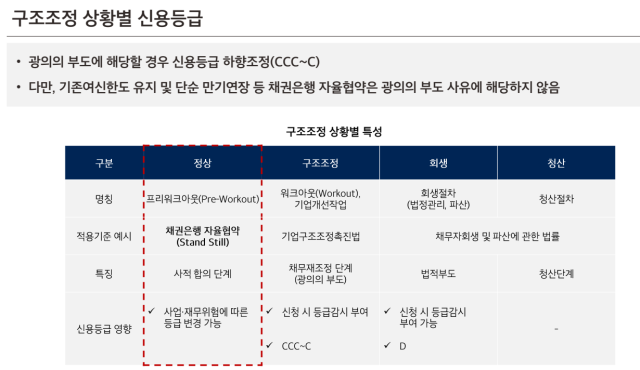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두고 국내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공모주 하나당 3억 원씩 투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40%(올해 30%)를 의무보유확약 신청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서의 단기 투자 현상과 ‘공모가 거품’으로 인한 주가 폭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공모 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증권사 역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상장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제도 개선이 불러올 부작용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역효과는 바로 ‘눈치 보기’였다.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의 1호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공모주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 확대와 관련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느낄 부담의 차이 때문이다. 대형사의 경우 의무보유 물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모 규모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3억~4억 원 정도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코스피의 경우 코스닥보다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무보유 기준을 채우기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관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후 수익성 둔화에 직면한 중소형 증권사들에는 이런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증권사에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미 상위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중소형사에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공모주 시장 활기 찾을까…코스닥 예심 심사 줄대기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S5URHZ_1.jpg)

![[MAHGA 테마주를 찾아] 레나 ②가벼워서 빠르다, 트럼프 '추진제' 주입](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