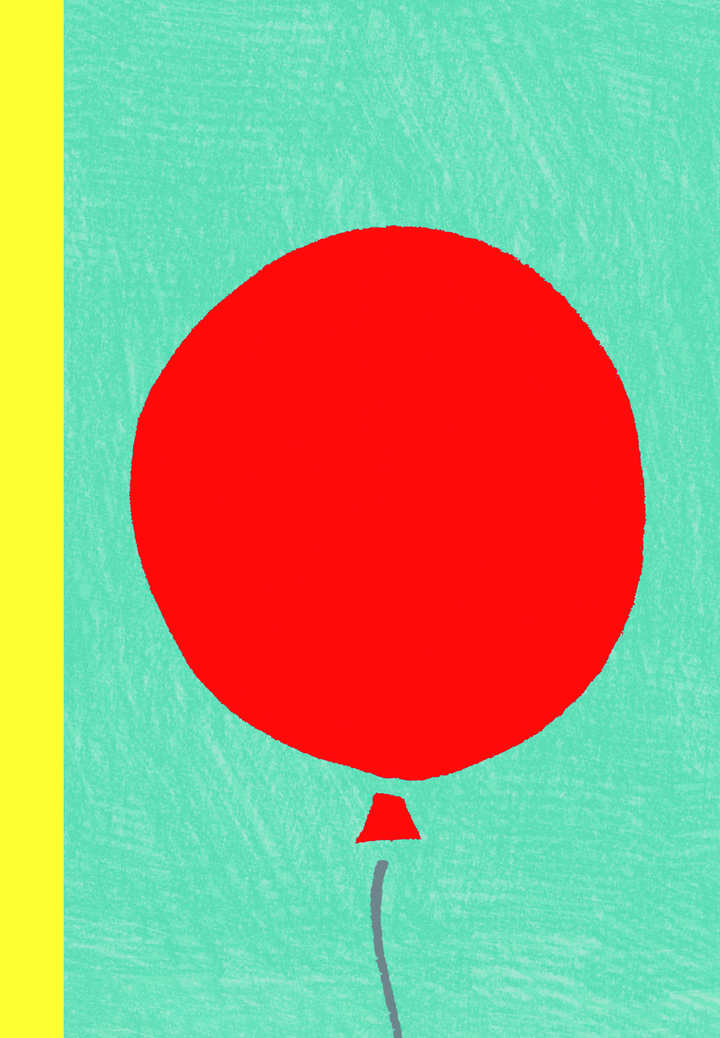김길웅 칼럼니스트

삼성혈 동쪽 길 건너에 대각사라는 조그만 대중 절이 있다. 당초에 불법을 크게 깨닫는다고 염원으로 대각사라 했으리라. 오래된 절이다. 광양에 살아, 지날 때마다 그 이름에 끌려 눈이 가곤 했더니, 오늘에야 내가 그 절문을 드나들게 될 줄이야.
불가사의한 게 사람의 인연인가 한다. 아내가 신심 깊은 불자라 무심할 수 없어 따라나서다 인연이 닿았으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말은 이렇지만 산문을 나들며 경문 하나 머리에 들지 않고 부처님오신날에나 찾으니, 나 자신 거북하고 어중간하다. 딱하고 부끄러운 노릇이다.
어느 날, 대각사 주지스님의 염불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우선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낭랑하고 화창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염불에 들어가며 그 초입에 읽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하고 ‘개경게’를 시작하는 스님의 음성이 어느새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슬며시 두 눈을 감게 한다. 스님의 목소리는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불경을 읽기 위해 타고나, 소리 자체로 감동이다. 신도들을, 그 가족과 함께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축원하는 대목에선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듣는 이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스님의 기도는 그래서 염불 때마다 신도들의 마음을 부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자그마치 이런 공감대가 젊은 신도들을 불러들여 절이 생기로 넘친다.
여기저기서 49재를 모신다는 바람에 스님이 몸을 혹사하신다. 요사체에 걸려 있는 큼직한 달력에 49재 메모가 빽빽하다. 한번은 주지실로 찾아뵀다가 스님의 공양하시는 걸 보고 놀랐다. 누룽지를 몇 숟갈 뜨고 있지 않은가.
“누룽지가 없는 날엔 물에 찬밥 두세 숟갈 말아먹으면 돼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위가 괜찮을까요?”
식생횔을 바꾸시라 몇 번 권했지만 귀에 넣지 않더니, 위암을 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충격이었다. 어느 기회에 걱정하는 말씀을 했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문제가 없습니다.”라며 밝게 웃는다.
암이 어디 쉬운 병인가. 스님 몸이 몰라보게 쇠해갔다. 위급해 병원에 가셨다더니 입적하셨다는 부음이다.
스님은 마음이 따뜻했던 분이다. 주민센터를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또 시설 등에 쌀 보시를 수없이 해오신 분이다.
생각난다. 우리 가족이 설날 절에 가 세배 올리면, 5000원 신권을 건네며 “이 돈은 복돈이니 쓰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라며 당신보다 나이 많은 내게까지 세뱃돈을 쥐어주시던 스님. 없어 가난한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줌으로써 스스로 위안 삼아 흐뭇해 하시던 관종 스님. 적멸(寂滅)에 드셨다. 당신 두 발로 걸어서 서울병원에 가시더니, 비행기 타고 침묵으로 돌아오셨다.
내 몸이 불편해 빈소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신세라 발을 동동 구른다.
“스님, 생로병사엔 차례가 없군요. 나이를 헤아립니다. 스님 향년이 71세, 제가 84세네요. 까짓것, 나이 따위라 하시겠지만, 먼저 떠나신 스님께 다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 한으로 맺힌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독경 소리가 그립습니다. 극락에서 조금만 더 목소리를 돋워주세요. 귀를 열어 놓을 테니까요.”

![[꼬꼬무 찐리뷰]임신하면 낙태 시키고, 죽으면 시체 해부까지…'비극의 섬' 소록도의 진실](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4/04/30000984356_1280.jpg)
![[초대시] 신영규 시인의 ‘철학이 말을 걸어오다’](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08643_694253_272.jpg)
![[송선헌의 시와 그림] 피라미드](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112_74549_1919.jpg)

![[이 아침에]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03/29f76832-a69a-4a75-8456-61a8c79749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