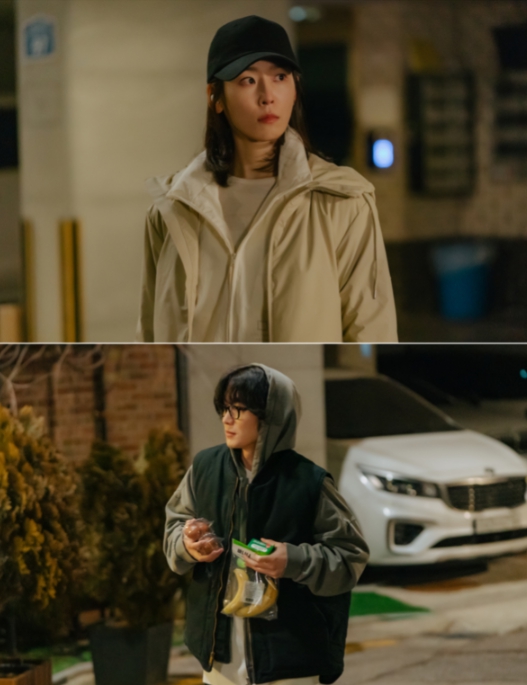조문욱 편집위원

필자(筆者)는 긴 이름을 머리에 새기는 일에 취약하다.
소설책을 읽을 때 홍길동 등 국내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중국 소설의 유비, 관우, 장비 등은 쉽게 소화해낸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처럼 일본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의 이름은 8글자 내외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책 옆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함께 놓고 읽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한 때 베스트셀러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코드라는 소설 역시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길다. 게다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서로 발음이 비슷해 헷갈려, 역시 책을 접었다.
필자가 대학시설 교양으로 철학 과목을 수강했었는데,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이 길기도 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라 누가 누군지 헷갈리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왼손바닥에 철학자들의 이름을 빼곡이 적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군(群)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인 ‘커닝’(cunning)을 영어권에서는 ‘치팅’(cheating)이라고 한다. ‘커닝’은 ‘교활한’이라는 뜻이다. 원래 치팅이라고 해야 맞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험이 있는 곳에는 커닝이 있었다.
과거제도가 시작된 중국의 커닝수법은 다양했다. 깨알 만한 글씨 70만자가 적힌 도포와, 가로 4.5㎝, 세로 3.8㎝, 두께 0.8㎝에 불과한 작은 책 9권에 10만자를 써 넣은 청나라 때 커닝페이퍼가 있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도 커닝 페이퍼를 콧구멍이나 붓뚜껑에 숨기기도 했다. 작은 책자나 종이에 출제빈도가 높은 시구를 빽빽하게 적는 ‘협책’(挾冊)도 있었다.
또한 과거시험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리시험 전문가인 거벽(巨擘)이 있었으며, 예상 답안을 시험장으로 갖고 가는 행위, 시험지 바꿔치기, 채점자 매수, 시험장 밖에서 작성한 답안을 들여보내기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시험장 내에서 서로 답안을 보여주기로 하는 접(接), 과거시험장의 좋은 자리를 선점해주는 선접군(先接軍) 등도 등장했었다.
1993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 답안을 유출하는 ‘선수’와, 이를 중개하는 ‘도우미’, 답을 제공받는 ‘수험생’으로 나뉘어 부정행위가 이뤄졌다.
2004년 수능 때는 휴대전화 문자 송신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시학원 원장 등이 연루됐으며, 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만 314명이었다.
최근 대학가에서 챗GPT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해 윤리의식 부재를 질타하는 의견이 많다.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과제나 논문 제출 등에까지 AI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챗GPT를 이용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스스로 과제를 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 “과제를 챗GPT를 이용해 제출했더니 A+를 받았다. 강의를 녹음해서 챗GPT에 주고 써 달라면 끝난다”라는 내용의 글들과 함께 “열심의 강의 듣고 이틀 밤을 세워 제출했는데 너무 허탈하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커닝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 한다.
공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노력과 헌신의 댓가가 성취라는 공식이 무너지면 혼돈을 초래한다.
AI커닝을 개인의 일탈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가치관 훼손이 더 큰 문제다.



![[삼성화재배 AI와 함께하는 바둑 해설] 잔잔한 흐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e22a04e9-a785-4135-ab2d-0d076272546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