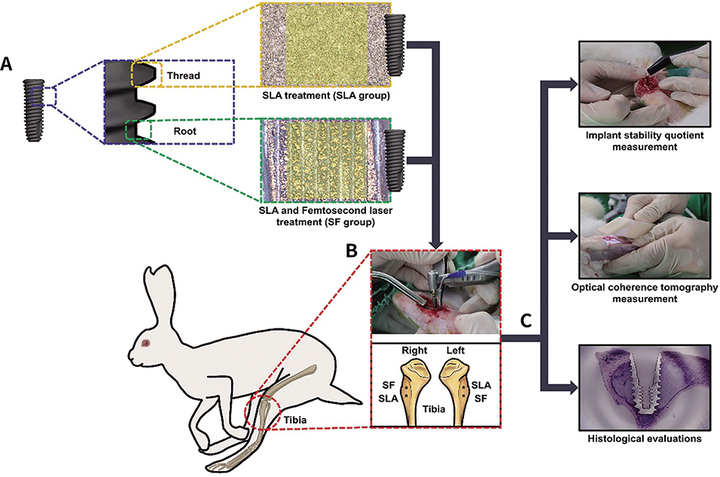희귀 유전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병에 관한 정보도 부족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단 방랑'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희귀 유전질환 다학제 진단 모델이 임상 현장에서 첫 결실을 거뒀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박미현 박사 공동 연구팀은 병명을 모르는 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기반의 다학제 진단 모델을 적용한 결과 4명 중 1명꼴로 2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에 기반해 의사, 유전학자, 유전상담사, 생물학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단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여기엔 유전체 분석을 통한 포괄적 진단은 물론 가족 단위 분석, 진단 전후 유전 상담, 후속적인 임상 개입이 포함됐다.
연구팀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국내 의료기관 8곳에서 진단명이 없는 희귀 유전질환 환자 387명과 가족 514명을 대상으로 진단 모델을 적용한 결과, 참여 환자 중 27%(104명)가 2개월 안에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이 나온 환자의 77.9%는 데옥시리보핵산(DNA) 염기 하나가 바뀐 변이거나 DNA 서열에서 염기 일부가 삽입 또는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40.7%는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유전 변이로 확인됐고, 37.3%는 부모에게는 없지만 환자인 자녀에게 새로 발생한 유전 변이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단율을 살펴보니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30.6%로 18세 이상 성인 환자(21.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유전체 이상으로 인한 질환은 비교적 어릴 때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이미 유전자 검사 이력이 있는 환자의 진단율은 34.9%로,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환자(20.3%)에 비해 높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검사 참여율이 높을수록 병을 찾아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유전체 검사를 받았을 때의 진단율은 70%로, 환자 혼자 검사를 받았을 때의 진단율(15.8%)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참여 환자의 4.7%(18명)는 당초 검사를 받은 증상이나 질환과는 무관하지만 향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150명의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장기이식, 가족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등 임상적인 개입을 시행했으며, 그 중 68명에게는 전문적인 유전 상담을 제공했다. 유전상담을 받은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더불어 정서적 수용성, 질환 관리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교수는 "이번 다학제 진단 모델을 통해 기존에 진단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서 새로운 유전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임상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 및 중개의학'(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