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청년들의 감금 사태에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감금된 범죄단지에서 현지 대사관에 구조 메일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었다거나, 목숨을 건 구조 요청에 ‘캄보디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는 식으로 응답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 취업자 줄고 비정규직 증가
범죄집단 ‘고수익 일자리’로 유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 쏟아야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 신고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도모는 정부의 첫 번째 책무 아닌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관료주의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주 정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럴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문제다. 캄보디아로 떠난 이들 상당수가 고수익 일자리 유혹에 넘어갔다. 지금도 각종 구인 사이트에 ‘월수입 수천만원’을 내걸고 청년들을 유인하는 광고가 수두룩하다.
혹자는 범죄꾼에 속은 어리석은 청춘들이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비난만 하기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지금 우리 사회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지난 8월만 해도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래 최대 규모의 취업자 감소다. 고용 안정성 높고, 복지가 괜찮다고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는 14개월 연속 감소하며 6만1000개 줄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다.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4%에서 38.2%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15~19세는 74.3%에서 89.9%로, 20~29세는 32.1%에서 43.1%로 대거 늘었다. 한국 고용시장의 양극화는 악명이 높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고용·임금·복지가 훨씬 열악하고, 정규직 전환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20대 취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불안하고 고달프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출범 4개월여, 이재명 정권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나. 그간 군사작전처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시동을 걸었다. 모두 고용시장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득권 근로자들을 위한 것일 뿐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청년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기업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을 잃으면 기존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진다.
대통령실로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협조를 부탁하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에 청년 채용 확대를 공개 요청한 것을 ‘노력’이라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밖에선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 기업의 전투적 공세에, 안에선 반기업 정책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현실은 과거처럼 적극적인 채용 확대 전략을 쓰기 어렵다.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은 결국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이 미국 제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거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 일자리 기여 1위다. 지난해에도 직접투자(FDI) 등으로 1만7909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도 2만4000개 이상 창출이 예상된다(비영리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이다. 정작 우리도 부족한 좋은 일자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격이다. 자국 일자리를 만들라고 혈맹을 상대로 휘두르는 트럼프 정부의 완력 행사는 분명 끔찍하다. 하지만 국민 일자리에 쏟는 그들의 진심만큼은 배워야 한다.
많은 청년이 실업과 빚의 늪에 빠져 있다. 청년들을 다시는 범죄도시로 내몰지 않겠다면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없는 사회의 방치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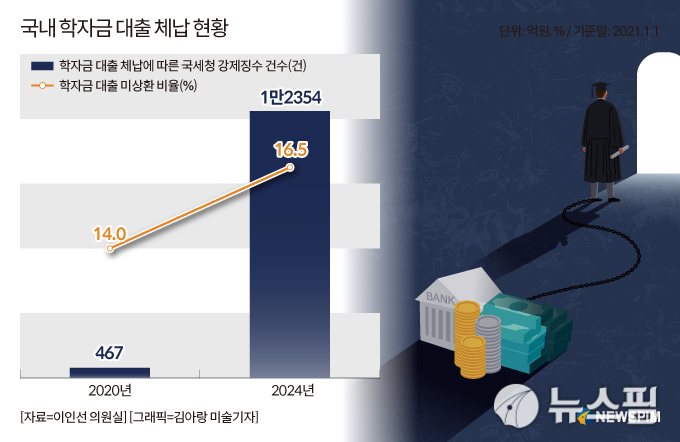





![[2025 국감] 여야, '캄보디아 사태' 경찰 대응 질타… '외사국 폐지' 도마 위로](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64833651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