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파트 2에서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차이점, 인공지능(AI)과의 시너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그 지향점은 다르다. 클라우드가 인프라 제공 방식, '무엇(What)'과 '어디(Where)'에 초점을 맞춘 컴퓨팅 모델이라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떻게(How)'에 집중하는 철학이자 방법론이다. 클라우드가 서비스형인프라(I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같은 서비스 분류로 정의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쿠버네티스, 서버리스(Serverless), MSA, API GW, CI/CD, DevSecOps 등 클라우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술과 문화를 포괄한다. 이는 곧, 확장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엔드 투 엔드 자동화를 구현하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가 기존 시스템을 아키텍처 변경 없이 그대로 옮기는 '리프트 앤드 시프트' 방식에 머무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는 클라우드의 진정한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가져올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
1. 비용 효율성 및 운영 최적화:AI 모델 개발을 위해 고사양 GPU VM을 24시간 운영하는 대신,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즉시 반납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워크로드 특성에 맞춰 학습에는 성능이 뛰어난 N사 칩을, 추론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B사 칩을 사용하는 아키텍처 설계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비즈니스 민첩성 확보:유연성, 확장성, 그리고 신속한 장애 대응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인 MSA, API GW, DevSecOps 파이프라인은 금융 서비스 혁신의 기폭제가 된다.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며,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자동화된 아키텍처를 통해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보안사고 예방과 동시에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을 MSA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특히 트랜잭션의 정합성이 중요한 계정계까지 무리하게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공통 기능이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보계, 채널계 업무부터 점진적으로 MSA를 도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 대응력을 높이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AI 에이전트도 MCP 등과 함께 위의 방법들을 접목하여 MSA 형태로 준비한다면 재활용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면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당장 부담스럽다면, 사내 환경에서 벤더가 제공하는 PaaS를 활용해 PaaS에서 제공되는 일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을 시작하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후 사내 환경과 퍼블릭(Public)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거쳐 퍼블릭을 활용한다면,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라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이 쉬워질 것이다.
정윤모 인스웨이브 상무 cloud@inswave.com


![IPO 나선 AI 기업 노타…강점과 리스크 분석해보니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55AN5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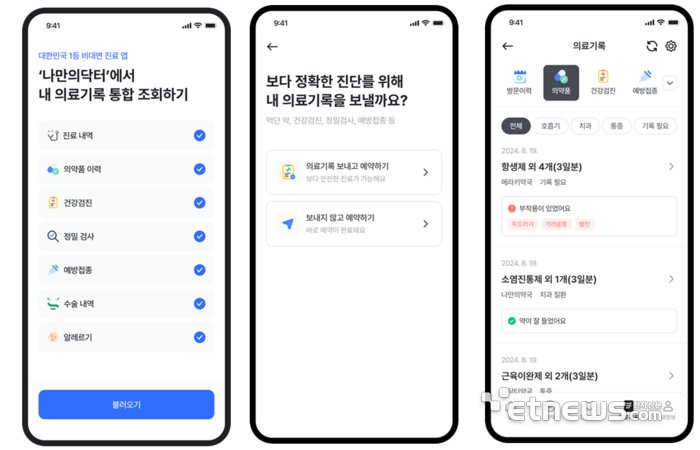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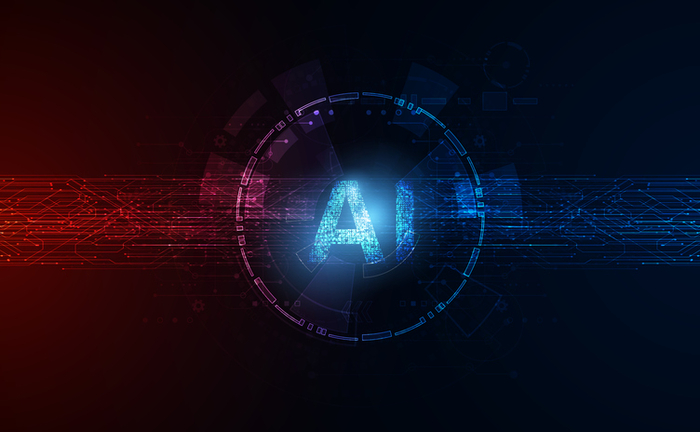

![노동·AI 패권, 휴머노이드에 달렸다…미·중이 목숨거는 이유 [실험실 밖 휴머노이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320f3985-2149-4831-90c3-64d6404937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