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딘지 모를 모호한 장소. 신발장으로 쓰이는 철제 선반 위로는 만능 깔판인 신문지가 깔렸다.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구두 한 켤레. 걸음걸이에 맞춰 난 신발 주름, 패인 앞코에도 불구하고 생을 가꿔가는 신발 주인의 의지처럼 구두는 반질반질 광이 난다. 신발 뒤꿈치에 덧댄 분홍색 안감이 파란 플라스틱 상자와 보색을 이루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윤흥길의 소설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크게 각인된 탓일까. 구두는 가장의 무게를 견디는 한국 남성의 상징처럼 왠지 모르게 쓸쓸한 여운을 풍기곤 한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구두 한 켤레에 이렇게나 의미를 부여할 일인가. 신발의 주인을 알 수는 없지만, 구두를 찍은 사진가에게도 이 한 켤레의 구두가 놓인 풍경이 의미심장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이메 페르무트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과테말라 출신의 사진가다. 한국 작가와 결혼한 뒤로도 줄곧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는 코로나19 시기 가족들과 함께 서울 근교로 이주했다.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카메라를 들고 종로와 을지로, 충무로를 쏘다니던 밤, 그는 길가 건물 귀퉁이에서 이 구두 한 켤레와 조우했다. 그 구두 앞에서 그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문화의 차이나 한동안 바뀐 적 없는 철 지난 신문지가 풍기는 무상함에 잠시 취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한국에서 시작한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한 연작의 제목은 볼 수 없음을 뜻하는 블라인드니스. 그것은 문화적 차이 속에 놓인 작가 자신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주류에서 빗겨 난 공간이나 삶에 주목해 왔던 그가 스스로를 이방의 조건에 놓은 채, 오로지 본능적으로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포착해낸 도심의 밤 풍경들은 어둠 속에서 실눈을 뜬 것처럼 오래 들여다볼수록 선명해진다.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강민숙의 시가 꽃피는 아침] (268) 정세훈 시인의 ‘겨울 암자로 가는 길’](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7269_736962_402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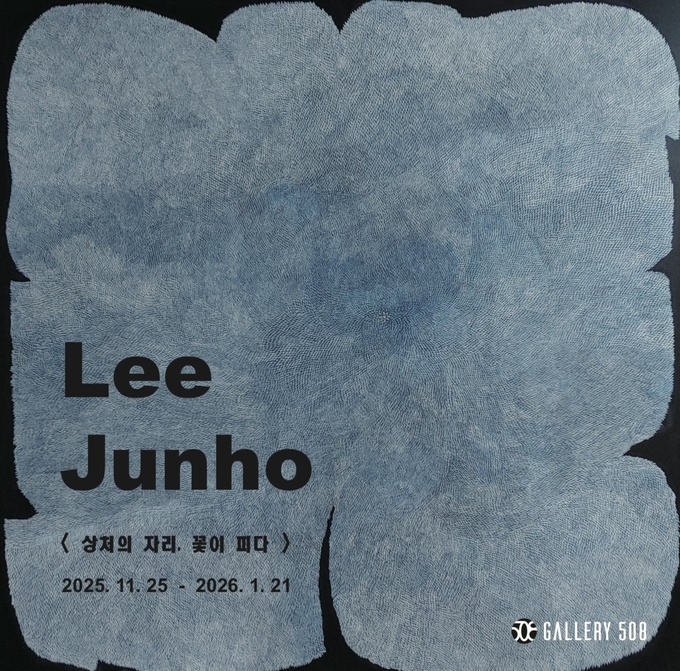

![[책꽂이] 형이상학적 동물들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11/29/da9c0e24-6d03-4abd-8fd7-1ccbce421b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