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가 vs 사기꾼’, 둘은 닮되 다르다. 가령 봉이 김선달은 어디에 가까울까? 대동강 물을 내다 판 스토리는 동의되나 평가는 엇갈린다. 즉 농락이건 혁신이건 중요한 건 세상에 맞선 아이디어다. 비즈니스의 본질도 비슷하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황금열쇠가 숨어있다. 행운·실력 모두 필요하나, 시대문제를 읽고 혁신해법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 핵심은 상품화다. 생수를 사 먹을지 몰랐듯 황당한 생각이 빛나는 사업을 열어주는 법이다. 한계취락의 로컬복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생각과 달라진 사업이 부각될 때다.
일본을 다녀왔다. 꽤 알려진 ‘나뭇잎 비즈니스’의 지속 여부가 궁금했다. 인구 1324명(2025년 3월)의 가미카쓰정(上勝町)을 세상에 알린 “나뭇잎을 팝니다”의 산간오지로 향했다. 사람은 없고 나무만 많은, 소멸경고가 자연스러운 벽지동네다. 반짝관심인지 지속성과인지 되물었다. 성과지표는 사업지속을 알려준다. 생선회에 곁들이는 장식잎을 내다파는 ㈜이로도리(彩り)는 건재했다. 1999년 지방자치단체 출자(1000만엔)로 4명이 시작한 비즈니스는 적자난관을 뚫고 2024년 3억8000만엔을 팔아냈다. 연수입 1000만엔 농가도 있다. 마을스토리가 영화 ‘이로도리 인생 2막’으로 제작되며 교류인구도 늘었다.
대박성과는 없다. 그럼에도 과거 30년, 미래 30년을 나뭇잎으로 먹고산다면 재생사업 치고는 탄탄하고 훌륭하다. 지역주민 1∼2명의 시행착오가 빚어낸 보물찾기는 혁신 속 진화한다. 시장안착·규모확대를 위한 끝없는 업그레이드다. 한계산촌이 채택한 태블릿·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실시간 주문·납품 정보망이 대표적이다. 공동체 분업구조도 꾸렸다. 원래 산에서 채취한 나뭇잎을 농가별·차별 재배로 내부 경쟁을 줄였다. 300여종 나뭇잎을 분업화한 것이다. 자신감은 마을재건으로 커간다. 주민제안의 쓰레기 제로사업이 먹혀들며 청정마을의 호텔·양조장 등 다각화로 확대됐다. 청년유입도 꾸준해졌다.
가미카쓰 로컬사업은 지역재생의 성공조건을 꽤 갖췄다. 반짝유행 속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른 한국로컬이 눈여겨봄 직하다. 방방곡곡 로컬리즘 귀환실험이 지속모델로 안착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핵심은 ‘지역한계=비즈니스’의 셈법이다. 장점자본을 띄우고 약점부채는 감추는 기존방식과의 결별을 권한다. 나뭇잎도 쓰레기도 그 과정에서 지역특유의 비즈니스가 됐다. 사회문제야말로 최강의 사업모델이란 뜻이다. 왜(why)란 질문도 로컬내부·주민주도일 때 체감·실효적이다. 즉 지속가능의 로컬리즘은 스스로 고민·행동할 때 비롯된다. 초고령화의 산촌오지가 증빙한 역발상의 힘이다.
자강은 공감되고, 선의는 지지된다.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을 향한 응원물결은 강력하다. 풀리기 힘든 과제일수록 도우려는 손길은 커진다. 정책·제도까지 관심을 갖는다. 가미카쓰의 로컬재생은 나뭇잎을 즐기려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수많은 눈길·발길로 완성된다. 사회문제의 비즈니스화라는 기업가정신에 동의할수록 지속가능성은 플러스된다. 실제 호텔·식당 등 외부호의는 돈 버는 나뭇잎을 키워낸 일등공신이다. 도매는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소매는 가치소비로 응원한다. 공동체를 위한 균형적인 질서회복은 파괴적인 탐욕우선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망각이 불러온 공멸현장을 정상화할 때다. 가미카쓰의 복원사업은 지속마을의 상식조건을 복기할 괜찮은 샘플사례 중 하나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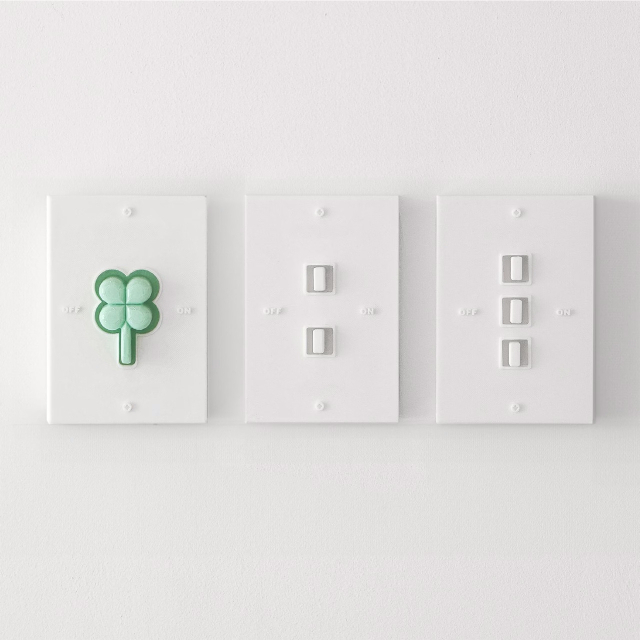
![[의당학술상] 패션·문화·출판 이어 자동차 부품까지 '사업 다각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3045998c-862a-4066-96bd-4fbf4768cb65.jpg)

![[귀농·귀촌 도우미] 달콤한 토종다래의 모든 것](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00057.png)
![지역발전 동반자 ‘건설업’… 대한민국 역사를 짓다 [지역경제의 개척자들]](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802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