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7일 작은형과 나는 투먼(圖們)대교 위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두만강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추석(9월 24일)이 40여 일 앞이었는데, 강 건너 아버지가 계시는 북한의 함경북도 어랑군까지는 직선거리로 170㎞,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자동차로 4시간 거리라고 했다.
당시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몇 년째 아버지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해 전에는 문화예술인 금강산 방문단에 포함돼 북한 땅을 밟은 김에 아버지와 접촉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하루 전날인 6일 옌지(延吉)를 찾은 것은 상봉 주선을 의뢰했던 조선족 브로커 조직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드디어 “기대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덟 살 위인 작은형과 나는 “어릴 때는 ‘아부지요’라고 불렀는데 이제 내가 환갑이 다 됐으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나는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이런 말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가슴이 설렜다. 아버지께 드리려고 노점상에서 북한 담배를 잔뜩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옌지의 숙소에서 받은 브로커의 전화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다. 다섯 달 전인 3월 22일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국민학생 때 헤어져 아버지를 또렷이 기억하는 형은 길게 울었지만 아무런 기억이 없는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부하(負荷), 제대로 된 사진조차 본 적 없어 막연한 추상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던 아버지가 결국 추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비로소 한 시대가 마감된다는 생각이었고, 숱한 고통과 슬픔을 치르고 떠났으리라는 생각에 연민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봉하러 갔다가 졸지에 망제 지내
나는 졸지에 상제(喪制)가 돼서 망제(望祭)를 올려야 했다. 아버지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안동소주를 두만강 변에서 제주(祭酒)로 바쳤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난 12일 조선족 브로커로부터 팩스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상봉을 위해 우선 이복 여동생 옥경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낮도깨비에 홀린 사람들처럼 작은형과 나는 이튿날 다시 옌지로 출국했고, 저녁에 여동생을 만났다. 서너 시간 가족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과연 여동생이 맞는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아버지의 최신 공민증을 제시해 달라고 브로커에게 요청했다.

내 부친 상봉 시도는 세간의 화제였다. 우리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이 TV와 일간지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15일 김포공항에서 귀국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복 여동생과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울며 부둥켜안기는커녕 서로 수사관처럼 캐묻다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도 분명히 기억하는 작은형은 우리가 만났던 여성이 여동생이 맞다고 확신했다. 아름답기보다는 거칠고 남성적이었던 할머니의 모습이 여동생의 얼굴에도 보이더라는 것이었다. 작은형은 여동생이 고향 석보(경북 영양) 얘기를 잘 알더라며 아버지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도 했다.
아버지는 독한 술을 드셔도 얼굴 한 번 찡그리는 법이 없으셨다는 여동생의 얘기가 기억난다. 술도 음식인데 기분 좋게 먹어야 한다고 평소 말씀하셨다는 거였다. 제딴에는 사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였을 텐데, 다른 집들이 잡곡밥만 먹을 때 아버지 밥상에는 그래도 이밥(쌀밥)을 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밥을 아버지는 꼭 절반만 드셨고 남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눠 먹었다는데, 차마 목이 메어 아버지 혼자 쌀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으셨을까 싶다.
(계속)

![[데스크의 눈] 위기의 외교… 헌신에 대한 기대](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9/202404095286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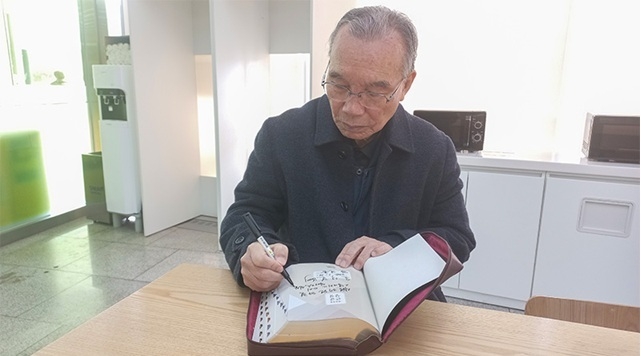
![[중앙칼럼] 소수계 중에서도 소수의 목소리](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1/40c78e44-40b4-465b-82e2-0896ce7873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