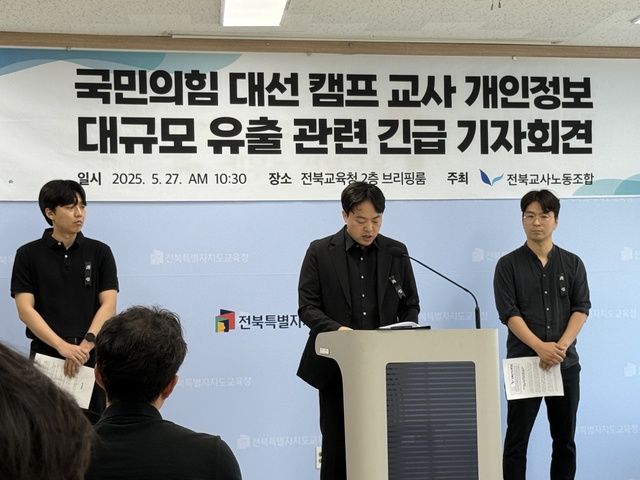서울대에서 지난해 사라진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가 시민 강의로 부활한다.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 강의지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어두운 이면을 비출 학문의 명맥은 이어지게 됐다.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기반으로 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 부활은 학생들의 자생적 노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폐강 당시 ‘수요와 교수진 부족’을 이유로 든 대학 측은, 학생들이 연서명으로 수요를 증명하고 강성윤 서울대 경제학부 강사가 강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불온한’ 경제학을 말려 죽여 퇴출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강 강사가 여름학기에 무료로 여는 ‘정치경제학 입문’ 강좌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26일 오전까지 재학생 160여명을 포함해 1500명이 넘는 수강인원이 모였다. 학문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자본과 시장 논리만이 판쳐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가 “주류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를 부르주아 칵테일 파티의 안줏감 정도로 여긴다”고 비판했듯,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이론을 늘 ‘눈엣가시’ 취급했다. 서울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는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한 2008년에도 대학 측의 후임 교수 미임용으로 명맥이 끊길 뻔했다. 군부독재 시절 금서였던 <자본론> 강의는 1987년 민주화 후에도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지난한 투쟁 끝에 1989년 처음 빛을 볼 수 있었다.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세계 자본주의 모순이 현실로 나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불평등·양극화로 극우까지 발호하는 오늘의 불온한 시대에도 폐강 위기를 겪는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학문의 다양성은 ‘비판적 사유’를 가능케 하기에 필수적이다. 모든 학문은 검증의 시련을 견딜 때만 유효하다. 시장 논리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폐강하고 고사시키려는 주류 경제학과 서울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주류 경제학의 과도한 ‘자본론 포비아’를 ‘코란’에 빗대기도 했는데, 아직도 마르크스가 그리 두려운 것인가.
![[에듀플러스]대선 후보마다 판이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앞으로의 향방은?…에듀테크 업계 '촉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9/news-p.v1.20250529.c8a9a790d4fa4deba8301ece0f97a7da_P1.jpg)

![[세계타워] ‘삼년지대계’ 교육정책](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518361.jpg)


![[시대의 표징] 대선 너머 할 일](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043254314_f9711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