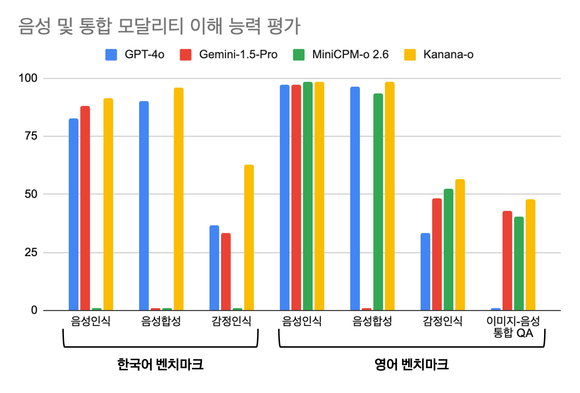AI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아는 것도 많고, 똑같은 걸 물어봐도 짜증 내는 일이 없다. 무한 반복해서 알려줄 뿐 아니라 무엇을 더 알려 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사소한 질문이나 엉뚱한 질문에 비난의 눈빛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볼 일이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길고 복잡한 과정 대신, 질문만 하면 정보를 모아 정리해 준다. 최근 들어 가장 유용했던 질문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발열 원인에 관한 질문이었다. 애견미용실에 다녀온 직후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성을 물었다. 스트레스, 감염, 과도한 드라이기 사용이나 알러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사람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학도서관도 없어지고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게다가 사람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알려 줄 때 잔소리하게 된다. 핀잔을 주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과거의 노인들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전달해 주고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 노인들의 무릎에 앉아 옛날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날씨를 가늠하고 계절에 맞는 농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던 나이 든 사람들. 하지만 현대화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런 풍경은 사라졌다. 공동체의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공동체 기억 전달자로서 노인 역할이 사라졌다.
배가 아플 때나 열이 날 때 노인들의 처방으로 아픔에서 벗어나고,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마을 어른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지금은 그 기억과 지식이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에 저장되었다. 결혼식에서 자식의 결혼을 주도하던 혼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예약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마치 손님처럼 예식장에 초대되어 일정한 역할 수행을 할 뿐이다. 아이를 키우거나 버릇을 들일 때도 몇 개월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하고 그걸 위해 부모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자세히 알 수 있다. 인간이 개인으로 살면서 겪고 보고 듣고 기억하던 것들은, 집단지성과 공동체의 막대한 데이터가 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시기는 30년 전인 1990년대 중반쯤이다. 그때 도스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 커서가 깜빡이던 흑백 화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특히 1995년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상업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인터넷은 점차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성장기에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도 잘 사용할 수 없었던 노인들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멀쩡한 종업원을 옆에 두고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점심을 먹을 수 있고, 기차표를 사기 위해 기차역에 일찍 가도 줄 선 사람 없는 텅 빈 대합실에 기차표가 매진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길가에서 손들고 택시를 잡아타던 시절은 지나가고 빈 택시들은 예약등을 켜고 손을 들어도 서지 않는다.
게다가 인터넷에 있는 집단 기억과 집단 데이터들로 인해 정보는 급속히 퍼지고 사라지고 또다시 생성된다. 어제 쓰던 언어들은 의미를 잃고 새로운 언어들이 사용된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로, 목표나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낄 때 쓰는 표현이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의 줄임말로, 대화나 상황이 갑자기 어색해질 때 사용한다.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말한다. 지금 ‘저는 계몽되었습니다’와 ‘난가병’이 유행이다. 정보에 어두워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육체도 약해지고 정보도 약해진다. 공동체의 기억 전달자로서 존중받던 자리는 AI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경험이 많고 오래 살수록 점점 아는 것이 없어진다.
조숙 시인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갑자기 컴퓨터가 파란색”…디지털 문맹 문제 해결하려면 [트랜D]](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09e9f539-0c5a-48eb-9de6-e806f184f252.jpg)
![[에듀플러스][교사가 pick한 에듀테크]팀모노리스 '코들', 정보수업 효과 높여…학습 분석 등 다양한 기능, 학생 맞춤·교사 주도 수업 가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30/news-p.v1.20250430.c8e6591eb4f344d49d55859fb4a5d91d_P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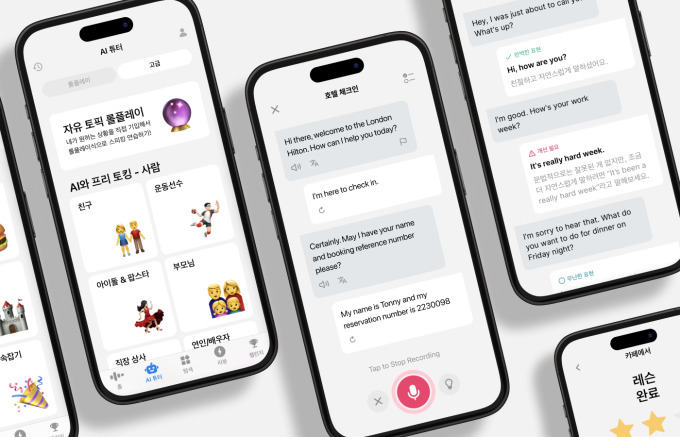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74〉인공지능 테크노스트레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30/news-p.v1.20250430.13af3af4897747fdaabbb034c969816d_P3.jpg)
![[주필칼럼] AI는 작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718204361_f83b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