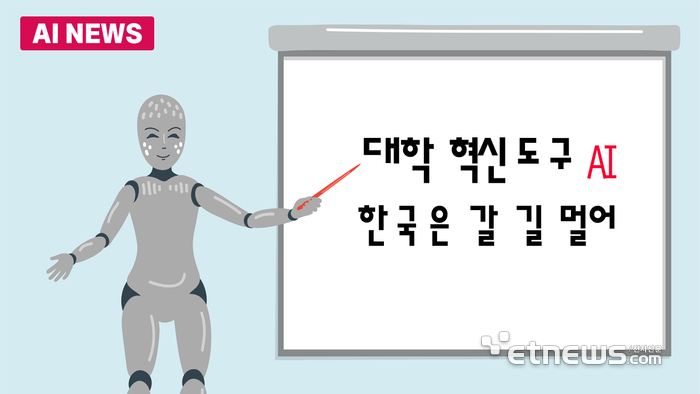‘웹’이 또다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용의자는 AI다. AI가 웹의 초기 정신을 파괴하고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의 탐색 방식을 뒤흔들며 웹 전반의 트래픽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도 덧붙인다. 1989년 탄생 이후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존했던 웹이 또다시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웹의 죽음 선언은 전혀 새롭지 않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아이템이다. 2001년 팀 버너스 리의 시맨틱 웹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2007년 아이폰발 모바일앱 생태계가 커져갈 때 ‘웹은 죽었다’는 얘기들이 유행했다. 2013년 구글이 구글 리더를 포기하고 RSS라는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 개방 규약이 종언을 고했을 때도 웹의 죽음 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페이스북의 ‘갇힌 정원’ 시스템도, 블록체인의 성장 한계도 웹의 죽음이라는 서사를 불러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웹은 늘 죽을 운명에 놓여왔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 세워놓은 웹의 묘비석만 세어도 10개는 훌쩍 넘을 것이다. 오히려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웹이 죽었다는 선언이 빨리 터져나오지 않은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종종 잊어버리곤 하지만 웹이라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실체는 세 가지다.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HTTP라는 전송 및 통신 규약, URI라는 문서 요소의 고유한 주소 체계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통합돼 브라우저 위의 ‘www’ 화면으로 구현된다.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스 리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통제나 차별 없는 웹의 진화를 희망했다. 웹의 성장은 그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웹의 역사는 끊임없는 독점화·중앙화와의 쟁투로 점철돼왔다. 특정 빅테크 기업이 웹 간 연결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고립된 독점 생태계를 구축할 때마다 웹은 매번 죽음 앞에 직면해야 했다. 그런 곡절에도 웹은 벌써 36년째 살아남았다.
이번 AI 시대의 위기는 이전과 결이 다르다.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품었던 꿈의 완성 여부가 걸린 싸움이어서다. 고희에 접어든 팀 버너스 리에겐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24년 전 실패로 여겨졌던 2001년 5월 논문의 비전, 바로 ‘시맨틱 웹’으로의 진화다. 여기엔 세 가지 웹 기술에 더해 지능형 에이전트, 즉 ‘AI 에이전트’의 연결이 필수다. 사용자를 위해 병원 예약을 대신하고, 여행 일정을 대신 짜주는 AI 에이전트를 월드와이드웹에 통합시켜야 시맨틱 웹이라는 그의 구상은 완수된다. 20여 년 만에 시맨틱 웹과 에이전트의 높은 기술 장벽은 거의 허물어졌다. 그의 숙원은 곧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열린 웹의 대척점에서 AI 기업들이 다시 독점욕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용자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AI 기업들은 관심이 없다. 그도 발버둥 치고 있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늘 그렇듯 웹이 생존은 할 수 있겠지만, 빅테크의 욕망을 누르고 그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간도 그의 편은 아니다. 오픈AI, 구글은 이미 자사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완성되려는 찰나, 그 웹의 초기 정신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성규 블루닷에이아이 대표>

![[북스&] 극우 포퓰리즘은 왜 세계를 휩쓰나…'역풍'으로 읽는 혁명의 400년사](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TT5IR_1.jpg)
![[10월 커버스토리] 26주년 맞은 지포스... 'GPU' 탄생이 바꾼 컴퓨터의 미래](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9/56137_153485_60.jpg)
![[사설] 韓, 글로벌 토큰경제 예의주시해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1/news-a.v1.20251001.8fadbd23b5544f9cbf95da4278c2a659_T1.jpg)

![AI 규제 급급하던 EU의 변심…1조6000억 대거 투입, 왜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757f7596-e7c6-4679-904d-88129ee2363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