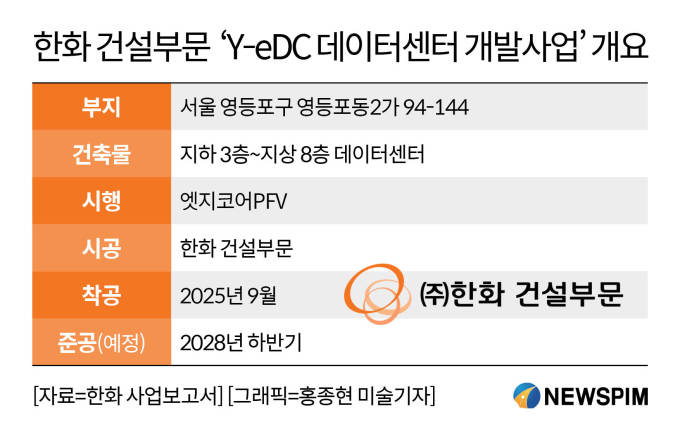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2027년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픈AI가 주도하는 7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기존 시장의 모든 예측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부상하면서다. 이는 단순한 대형 수주를 넘어, 메모리 시장의 수요 곡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앞다퉈 내놓았던 장밋빛 보고서들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27년 정점론’ 흔드는 700조 변수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은 메모리 슈퍼사이클 정점을 2027년으로 예측했다. AI 서버의 점진적 확산과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AI 패러다임 전환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을 겪다 2027년 정점을 찍는다는게 이들 전망의 골자였다. 이는 예측 가능한 설비 투자(CAPEX) 주기와 수요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스타게이트라는 ‘블랙 스완’이 빠져 있었다.
스타게이트가 던진 충격의 핵심은 전례 없는 수요의 규모와 형태에 있다. 이 프로젝트 하나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물량은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90만 장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마이크론 메모리 3사의 HBM 월 생산량은 현재 기준으로 40만 장 수준이다. 이 중 마이크론은 5만 장에 불과하다.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HBM 월 90만 장은 국내 반도체 업체 생산량의 2.6배에 해당한다. 대규모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지금 SK와 삼성이 운영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만 봐도 두 배 정도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메모리 3사가 공급 가능한 D램은 웨이퍼 기준으로 월 150만 장 규모다. 마이크론은 이 중 5분의 1(35만 장)을 차지한다.
이는 기존의 점진적 수요 증가 모델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요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의 특성상, 메모리 수요는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산봉우리’ 형태가 아니라,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고원(Plateau)’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HBM이 촉발한 D램·낸드 연쇄 파급 효과
스타게이트의 파급 효과는 메모리 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다. HBM은 이번 슈퍼사이클의 주역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메모리들의 동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전환해야 한다. HBM 다이(Die)는 일반 D램보다 면적이 1.5배에서 2배가량 크고 공정이 복잡해, 웨이퍼 한 장을 투입해도 최종 생산되는 용량은 훨씬 적다. 결국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일반 서버와 PC에 쓰이는 DDR5 D램의 공급은 줄어드는 ‘생산 잠식 효과’가 발생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
한때 ‘미운 오리’ 취급을 받던 낸드플래시 시장의 반전은 더욱 극적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고용량·고성능 기업용 SSD(eSSD)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고용량 QLC 낸드 신규 주문량이 2025년 전체 eSSD 시장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을 정도다.
‘K-반도체 독주 시대’…삼성·SK, AI 수혜 집중
이 거대한 기회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초기부터 이어진 과감한 투자와 기술 리더십이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과실로 돌아온 셈이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다소 추격자의 입장이었지만, D램과 낸드 모두에서 세계 1위인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특히 삼성물산(건설), 삼성SDS(IT서비스) 등 그룹 전체가 참여하는 ‘원팀’ 전략은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 AI 인프라 구축의 동반자라는 차별화된 위상을 부여했다.
장밋빛 전망 속 남은 변수들
물론 변수는 존재한다. 첨단 패키징 기술인 TSMC의 칩온웨이퍼온서브스트레이트(CoWoS) 생산 능력이 AI 가속기 생산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허가 문제도 장기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불가능성 속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호황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망을 한국이 장악하는 ‘K-반도체 독주 시대’의 서막을 여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ESG 칼럼] 내수형 중소기업을 위한 ESG 전략](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040/art_17596264941751_d8c44c.jpg?iqs=0.594655255868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