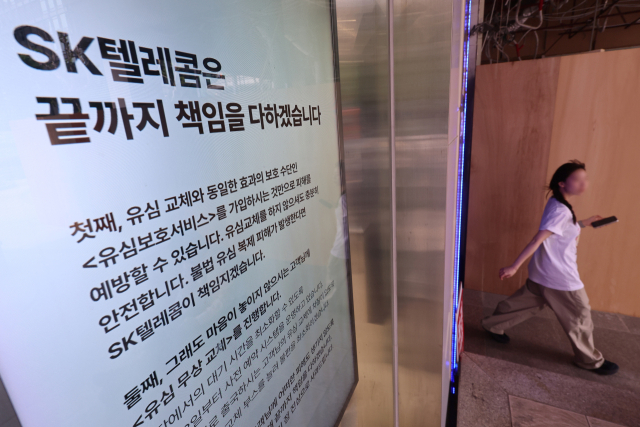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 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회사들이 요즘 로펌에 특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관련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결과 통지 관련 근로기준법상 조사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때 우선 고려 할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 의무와의 관계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보자가 피해근로자가 아닌 경우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해근로자인 경우라도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보자에게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피해근로자는 회사가 어떻게 향후 조치를 취할지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피해근로자가 조사 결과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다면 피해근로자로서는 사안을 외부 기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사안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의무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향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 해 줄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말해주어야 할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조사 관련 신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었고 완료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일반적인 사실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보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결론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준의 징계(정직, 감봉 등), 인사 조치에 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종 피해근로자 또는 제보자가 제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결론뿐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괴롭힘 판단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누구 진술을 더 신뢰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상당히 난처한데 이때는 위에서 언급된 비밀유지 및 나아가 조사 내용이 공유 되었을 경우 직원들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 불화가 발생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보 공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에서 여러 혼선이 있는데, 피해근로자의 알권리, 의견청취 관련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행위자 및 참고인의 개인정보, 명예훼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