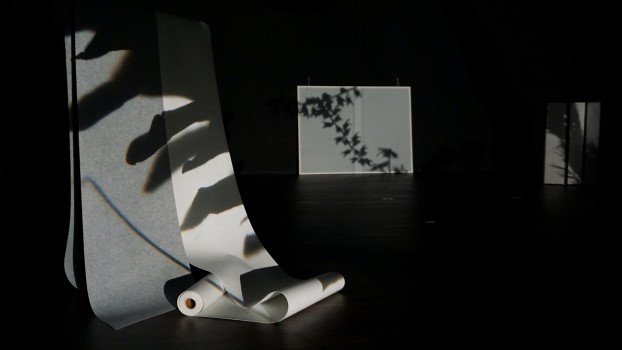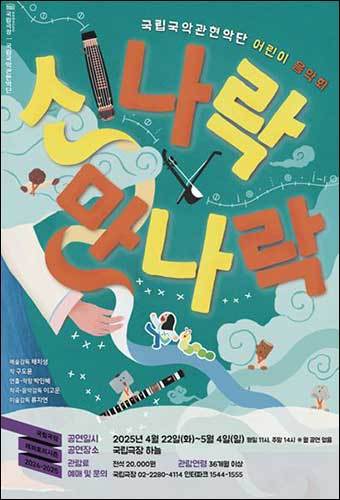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피에르 불레즈(1925~2016)는 말로 수류탄을 여러 번 던졌다. 박물관이 되어버린 콘서트홀을 경멸했고, 전통을 의심했다. 음악의 어법에서 아인슈타인급 전환을 이룬 작곡가 아널드 쇤베르크에 대해 “쇤베르크는 죽었다”고 선언한 이도 불레즈였다. 물론 한때는 쇤베르크의 기법에 매료됐지만 말이다.
그는 라벨·스트라빈스키, 그리고 미국의 음악에도 신랄한 비평을 퍼부었다. 불레즈의 스승인 올리비에 메시앙은 “첫 수업에서는 아주 착했다. 하지만 곧 온 세상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꼭 야생에서 생포된 사자 같았다”고 회고했다.
연구가 필요한 작곡가 불레즈
탄생 100년 맞아 재조명 풍성
전통 해체, 거친 면박으로 악명
곡의 논리 파악하면 황홀경

성질 깐깐한 불레즈의 100번째 생일(3월 26일)을 많은 나라가 축하했다. 파리 오케스트라는 지난달 26~28일을 불레즈의 날로 보냈고, 런던 바비칸 센터는 30일 ‘완전한 불레즈의 날’의 행사를 열었다. 그가 정착했던 도시인 바덴바덴은 지난해 말부터 온 도시 곳곳에서 불레즈를 기념하고 있다.
불레즈는 1971~77년 뉴욕 필하모닉도 이끌었기 때문에 뉴욕 또한 공연을 했다. 불레즈 생전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뉴욕의 축하는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들긴 한다. 마지막까지 명예 지휘자로 머물렀던 시카고 심포니는 성의껏 공연과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의 통영국제음악제도 이달 5일 불레즈가 만든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을 초청해 그의 음악을 연주한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의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탄생 150주년),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서거 50주기)보다 더 활발히 조명되고 있다.
작곡가로서 그는 전통에 과감하게 도전했다. 비타협적인 태도가 예술가의 의무라 믿었고, 날카로운 분노에 찬 음악을 만들었다. 음악의 요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짜면서 새로움을 추구했고, 20세기 모더니즘의 맨 앞에 섰다.
영국의 평론가 이번 휴이트는 불레즈의 음악에 대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인간의 영원한 충동”이라 했다.
천재적이고 독보적이지만 친구 하기는 싫은 예술가들이 더러 있는데, 불레즈는 그 대표 주자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악보를 한 번 읽기도 복잡한 현대 음악의 리허설 도중 작은 쉼표 하나까지도 기계처럼 기억해 챙기고, 이를 잘 지키지 못한 연주자에게 면박을 줬다는 일화는 많다. 오죽하면 영국의 가디언은 불레즈와의 음악 작업에 대해 ‘실력 없는 연주자는 화를 입는다’라 표현했다. 소리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발달했다.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는 “지휘자로서의 귀가 전 세계 최고”라 평했다.
문제는 ‘생포된 사자’ 같은 천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다. 불레즈가 1970년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들어보자. 흔히 ‘운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랑받는 이 작품을 불레즈는 독특하게 해석해 논란이 됐다. 일단 첫 악장이 너무 느리다. 악보의 X레이 정도가 아니라 MRI라도 찍는 것처럼 모든 마디, 모든 음표가 들리도록 연주한다.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뉴욕에서는 “똑똑한 오케스트라 기술자”라는 비꼬는 평을 들었다.
그가 만든 음악은 또 어렵다. 세계 대전 직후의 모더니스트답게 난해하다. 현대 음악의 권위자인 지휘자·작곡가 마티아스 핀처는 뉴욕타임스에 “안전벨트를 매고 소매를 걷고 연구해야 하는 음악”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음악가와 청중은 불레즈의 음악을 만나기까지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핀처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인 구조를 일단 파악하고 나면, 음악을 연주하고 들을 때는 그 연구를 잊어버리고 에너지와 흐름에 몰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황홀경을 제시했다.
거친 독설가의 어려운 음악에 대해 세계 음악계가 보내는 따뜻한 환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디언은 “지금은 불레즈와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담한 탐구가 장려되지 않는 시대”라고 했다. 말로든 작품으로든 수류탄을 던져대는 예술가는 옛 시대의 이야기가 됐다. “나는 규칙을 깨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던 불레즈의 오만한 모더니즘이 은근한 향수를 자극한다.
까칠한 예술가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요즘 청중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뜨겁고 독창적이었던 불레즈의 100세 생일잔치에 이런 질문이 떠돌고 있다.
김호정 음악 에디터

![[삶과문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가 수놓은 아름다운 세상](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7/20250227519964.jpg)
![[박일호의미술여행] 색채의 세계로 재탄생한 도시 풍경](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217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