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이모저모-1]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의학교실 류재인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의학교실 류재인 교수가 올 9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류 교수는 심포지엄 등 강연을 들으며 이를 기록하고 건치신문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버드 이모저모』란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 편집자 주
안식년 가는 것이 확정되고,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Harvard University)에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동부는 경험이 많지 않아 한번 가보자는 마음도 컸다. 하지만 안식년 방문학자라는 나의 가벼운 마음과 달리 하버드대 통과 관문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너의 연구 주제는 무엇이냐,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와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냐는, 여러 차례 통과 관문을 거친 뒤 와도 좋다는 최종 답장을 받고 약간 현실 같지 않은 마음과 함께 가서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에 동부의 생활비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터라 기쁜 마음도 잠시 여러 가지 걱정도 들었지만 언제 또 가겠나 싶은 기회라는 의지도 생겼다.



막상 와서 보니 미국도 우리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고, 말로만 듣던 보스턴의 높은 월세를 경험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지만, 어차피 떠나왔으니, 이곳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경험하려고 하고 있다. 방문학자 등록을 위해 처음 하버드대를 방문했던 날이 기억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들떠 있기도 했다. 내가 하버드를 오다니. 사실 지금도 가끔 현실감이 없지만,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동네인지라 그 뒤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온 열정 가득한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도 귀한 시간이다.
보스턴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미국에 대한 내 기억의 오류이다. 내가 아는 미국은 얼굴 보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언제나 편한 복장으로 지내는, 자동차는 절대 서행하며, 도로에 경적 따위는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동부인 보스턴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보다 사람들의 인상이 차갑고, 정장이 어색하지 않으며, 운전이 거칠고, 조금만 늦어지면 귀를 때리는 경적을 울려대곤 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어쩌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미국이라는 국가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는 자각이 들었다. 내가 안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오만. 우리는 종종 사건과 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곤 한다. 그 말은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타자에게도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은 거리가 좁아질수록 늘어나고 강해지곤 한다. 그래서 떠나와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리감, 즉 내 생각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고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쉬어감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글을 뭐로 시작해야 할까, 생각하던 와중에 하버드대 의학도서관(Countway Library)에서 ‘의학적 불의의 역사적 기원(The Historical Roots of Injustice in Medicine)’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메일이 왔다. 그것도 ‘우생학, 나치즘, 그리고 저널(Eugenics, Nazism, and the Journal)’이라는 제목으로. 하버드에는 행사와 강연이 매우 많은데, 다양한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등장하곤 한다. 이번 행사도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이 후원하는데, 해당 저널은 하버드의 다른 행사에서도 종종 후원단체로 나타나곤 한다.

이름부터 하버드가 속해있는 매사추세추 지역을 뜻하는 뉴잉글랜드 의학잡지이지만, 2023년 기준 전 세계 의학잡지 1등인 영국의 LANCET(Impact Factor 98.4)에 이어 2등(Impact Factor 96.2)일 정도로 권위가 있는 저널이다. 그렇다 보니 섭외되는 발표자도 그렇지만 행사 때마다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며 기념품 등도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어쩔 땐 놀랍기도 하고 매우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 대학의 일반적인 문화인가 싶기도 했는데, 다른 대학 행사를 다녀온 지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하버드는 자원이 풍부한 곳임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다.
우생학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1883년 영국의 F.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했는데,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생학은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사 과학의 일종이다. 지금은 유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놀랍게도 한때는 많은 사람에게 과학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수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들이 저널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우생학은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번성했지만, 역설적으로 1930년대부터는 독일에서 시작된 반 유대인의 나치즘 광풍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생학과 나치즘이라는 인종차별의 광풍이 불 때 NEJM은 무엇을 했는가가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 이번 심포지엄은 그걸 발표하는 자리였다.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국 내 상황이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대한 논쟁을 보며, 옳고 그름에 대한 지난 역사를 고찰해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해당 시리즈 논문은 모두 다음과 같은 글귀로 시작한다.
“이번 논문은 역사학자 등 외부에 의뢰하여 우리 저널에서 편견과 옮지 않음이 계속되었던 역사를 돌아보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This article is part of an invited series by independent historians, focused on biases and injustice that the Journal has historically helped to perpetuate. We hope it will enable us to learn from our mistakes and prevent new ones.”
심포지엄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저자는 우생학이나 나치즘이 요즘에 없어졌느냐는 질문에, 사그라들었을 뿐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이름과 형태를 바뀌었을 뿐이라고. 또 다른 저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은 우리네 모습이라고도 했다.

우주로 여행 가는 요즘 세상에도 여전히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격차 등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무수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라는 오래된 유명 사립 대학은 대부분 □자 구조로 지어져 있다. 더 오래전 지어진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도 마찬가지. 이러한 구조는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학문에 집중할 수 있게도 하지만, 울타리 안의 세계를 외부와 단절시킬 수도 있다. ‘사회와 건강(Society and Health)’이라는 강의에서 미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단독주택이 많은 편인데, 부유한 지역일수록 큰 규모의 단독주택이 많다. 그런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한다.
아파트는 정해진 구역 내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어서 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안정화가 곧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를 막게 된다. 어느 곳에서나 주택가격이 인상되면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법을 신설하여 아파트를 지으면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반대의 상황이지만 어느 사회나 주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외부를 단절시키고, 장벽 안의 것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만의 동의와 지지를 강력하게 키워간다. 이러한 문화는 엘리트에 의한 초고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단절과 내부 고립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하기 쉽다.

내 생각의 장벽은 무엇이었나. 미국의 서부 문화를 미국으로 일반화했던 오류. 서부는 동부에 비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어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미국의 전부일 것이라는 일종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이것이 서부와 동부의 차이인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내가 알았던 한 단면이 미국이라는 객체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것만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곤 한다. 이러한 나의 짐작이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타인을 통해 강화되면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화되곤 한다. 저 멀리,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되돌아보는 성찰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더욱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성찰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해지고 간격이 좁아지면, 세상과 나를 되돌아볼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다.
보스턴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설악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도시임에도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나 빌딩이 적어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의 조화를 저 너머까지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느끼는 물리적 정서적 여유로움은, 아마도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적은 것도 꽤 많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떠나오기 전 좀 지쳐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네 젊은이, 학자, 직장인들을 만나다 보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든다. 또 한국마트가 소설에도 나올 만큼 유명해지고 다른 아시안마트보다 잘 되어서 기분이 좋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궁금해하고 BTS나 K-drama를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걸 보니, 정말로, 어쩌면, 떠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건가 싶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혼혈인·무슬림도 입대… “문화 달라도 하나된 軍 만들어야”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5175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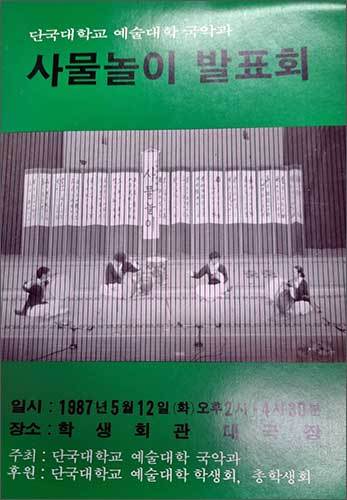

![[홍장호의 사자성어와 만인보] 선우후락(先憂後樂)과 범중엄(范仲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5/7723e670-8238-45d6-bd25-6f49401746b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