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예대율 규제가 중소기업의 비(非)은행 대출 의존도를 더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권을 찾으면서 ‘그림자 금융’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재빈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와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고용부장, 임현준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은행대출 채널 평가: 한국 예대율 규제의 증거’를 최근 해외 유명 학술지에 게재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로 한국은 은행이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를 없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 예대율 규제를 다시 도입한 역사가 있다.
연구진은 순수한 예대율 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 2009년 규제 발표부터 2012년 시행 시점까지 국내 14개 시중은행과 해당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 데이터를 추적했다. 이 기간 은행 예대율은 평균 112.9%에서 94.3%로 낮아졌다.
분석 결과 규제 도입 후 예대율이 기준치보다 높은 은행들은 기존 중소기업 거래를 끊으면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른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대체하며 신용 공급을 확보했다.
반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은 여러 은행과 거래 관계를 활용해 대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다수 은행과의 거래, 높은 신용도와 우량 담보 등으로 대체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전체 매출·투자 등 외형 성장면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지 않아 실물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 금융권 대출 평균은 약 8582만 원에서 1억 194만 원으로 1612만 원(약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수도 1만 7853개에서 1만 8249개로 늘었다.
문제는 은행에서 막힌 신용이 비은행으로 몰리면서 금융 리스크가 이동한 점이다. 연구진은 “예대율 규제가 은행권 위기 예방에는 기여했지만 그림자 금융 확대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가 비은행권으로 전가됐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평가했다. 은행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려던 정책이 동일한 리스크를 비은행권으로 옮긴 셈이어서 초기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예대율 규제는 은행들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만 줄이는 문제로만 인식돼 왔다. 아울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이미 도입된 글로벌 규제와 중복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안 이코노미스트와 김 부장 등의 연구를 통해 예기치 못한 풍선효과가 확인되면서 비은행권까지 고려한 정교한 규제 설계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계기로 비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현재 한은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검사 권한이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은행 금융회사를 공동 검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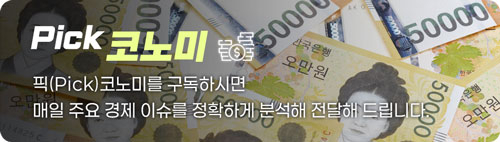

![[Biz & Now] 수출입은행, 15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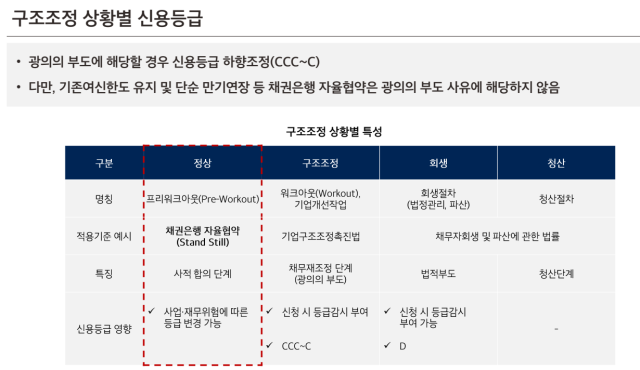
![[GAM]소비지표 3개월 연속 둔화, 中 서비스 중심 소비진작책 발표](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 ‘고신용자=부자’는 잘못된 접근…채권개미, 국채 순매수 비중 50% 돌파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7W12L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