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할 뿐 태연하지 못하다.” 국어사전은 ‘태연(泰然)’을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로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흔히 ‘클 태’라고 훈독하는 ‘泰’는 태산처럼 크고 장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연의 진짜 속뜻은 ‘스스로를 크고 장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다.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이다. 그런데 군자는 태연과 교만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처신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태연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만할 뿐 태연하지 못하다.

자신을 크게 여겨 잘난 체하는 병적증세를 일컬어 ‘자대증(自大症)’이라고 한다. 태연함과는 거리가 먼 자대증은 곧바로 ‘갑질’로 이어진다. “나 ○○인데 나를 못 알아보다니? 괘씸한 놈!” 소인의 교만한 자대증에서 비롯되는 갑질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 힘듦을 당한 사람의 한숨은 독(毒)이 되어 결국은 자대증 환자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 교만한 자의 권세는 10년을 잇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권력이든 돈이든 많이 가진 자여! ‘태이불교’의 인품으로 그 ‘가짐’을 더욱 빛나게 하소서!
김병기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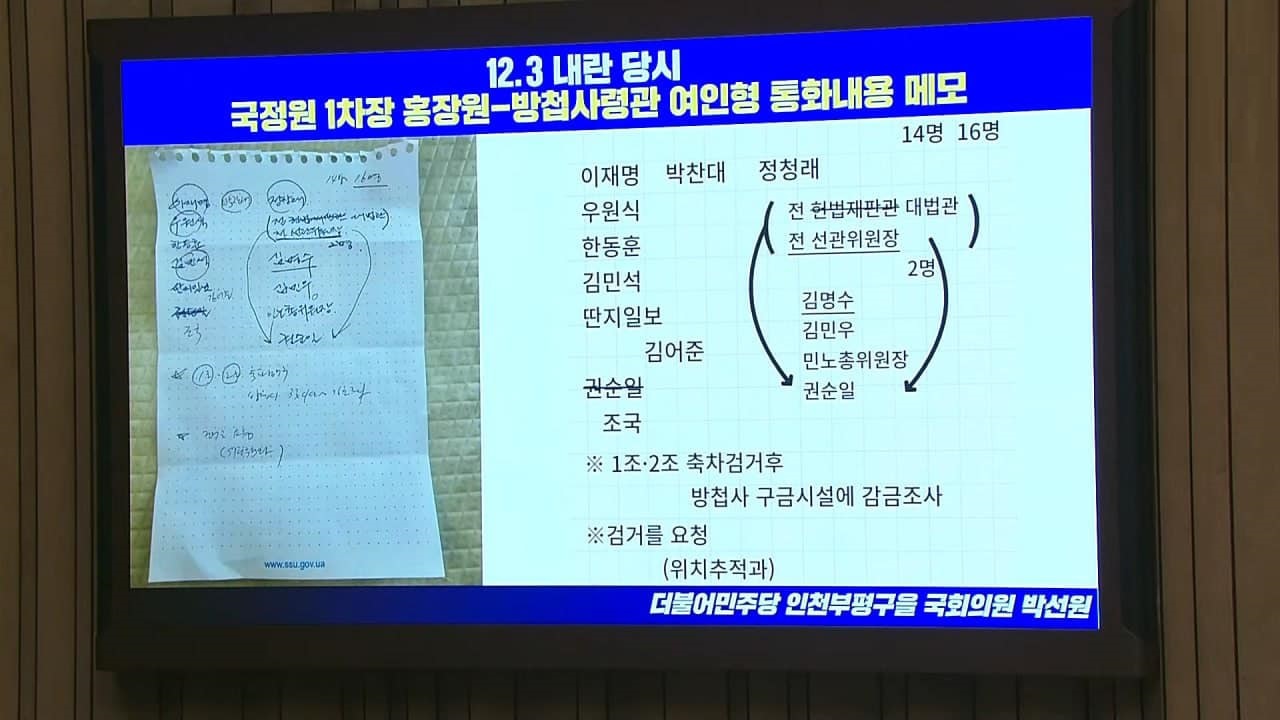
![한국인의 영어울렁증을 '비대한 자아 내려놓기'로 풀어낸 유니콘 [정혜진의 라스트컴퍼니]](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RXCCB_1.png)
![[논픽션-귀를 막아도 들리는 비명(悲鳴)소리] 세이산방(洗耳山房)(1)](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27/p1065605233719445_645_thu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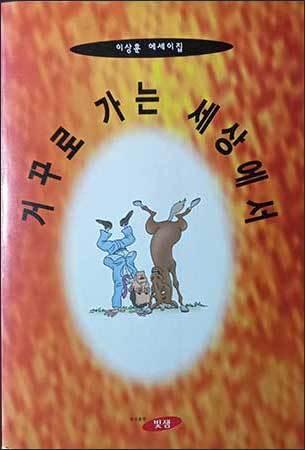
![[권오기의 문화기행] 잘 놀자](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27/p1065604690165067_370_thu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