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딥시크(Deepseek)’ 등장에 따른 충격으로 개발자들을 키워낸 칭화대 등 중국의 이공계 분야 교육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내 AI분야 전문가 5인을 통해 국내의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기초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 유출, 규제 등이 인재 양성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에 인재가 없다…“우수 인재들 의대‧해외로”
전문가들은 우수 인재가 AI 분야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성환 고려대 AI대학원장은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70~80년대 우수 인재들이 공대로 진학해 연구개발에 힘썼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대신 민간 기업이나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많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열악한 연구 환경 때문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분야 학생들은 졸업 후 갈 기업이 부족해 진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연구 환경과 처우가 나은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관련 분야 교수들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대학에서 10년 육성한 교수들이 기업으로 이직하면 7~8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대학이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관련 학과를 많이 만들었지만 가르칠 교수는 부족하다”고 했다.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도 “문과 교수와 같은 연봉 받고 누가 오겠나”라고 꼬집었다.

빈약한 산학협력 체계
AI 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데에는 빈약한 산학협력 체계도 거론된다. 미국은 기업 주도,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승 원장은 “한국은 대학과 산업계 사이 접점이 부족하다”며 “산업체들은 기술이 필요해도 대학을 찾지 않고 자체 연구소와 연구 인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주 포스텍 AI연구원장은 “산학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데 장기간 불경기에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사이 간극으로 산학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원은 주로 논문을 잘 쓰는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로, 대학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실용적인 기술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성환 원장)는 설명이다.
베이징대, 1년 만에 공대생 40% 늘었는데…한국은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도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염 부위원장은 “베이징대는 최근 1년 사이 공대생이 40%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그만큼 대학에서 인재 육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한국에선 대학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학 등록금은 해외 대학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연구성과가 글로벌 톱 수준이 되길 바라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달아놓고 왜 못 뛰냐고 물어보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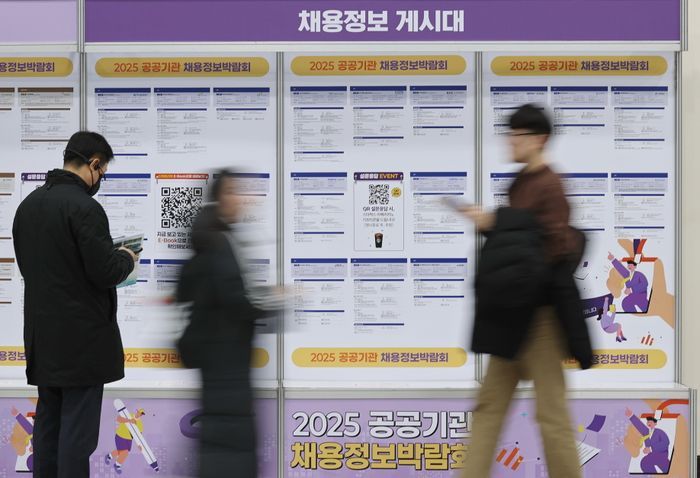
!["中천재 절반은 칭화대에 있고, 칭화대 천재 절반은 AI전사" [딥시크 쇼크 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5f8643d3-c2aa-4ff7-a1fc-e59591c6fe0a.jpg)
![AI·반도체 신사업 확대 vs. 일반 제조업 정체… 청년 일자리 지형도 바뀔까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5/2GOUNSEXY0_1.jpg)




![[알쓸비법]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02-71057-sample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