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썩은 나무엔 새길 수 없다(朽木不可雕也)
3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 걸린 서예 150여점 중 심석(心石) 김병기(71) 전북대 명예교수가 꼽은 한 구절이다. 제자 재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흙이 식은 담장은 흙손질할 수 없다”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김 명예교수는 “1년 전 오늘 우리가 계엄을 겪고 보니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다.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안으론 나라가 썩어 있더라. 다시금 쌩쌩하고 질기고 단단하고 야무진 나무로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시된 글귀 중 50점이 『논어』다. 전시는 8일까지 열리며,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그가 직접 안내한다. '이야기가 있는 서예전'이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중앙일보에 『논어』 속 한 구절을 쓰고, 짧게 해설한 칼럼 '필향만리'를 연재하고 있다. 최근엔 책 『필향만리: 서예로 읽는 2500년 논어의 지혜』(중앙북스)도 출간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필향만리'를 위해 논어의 구절을 고르고,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 써서 연재하는 2년여 동안 마음이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그는 강암(剛菴) 송성용(1913~99)을 사사했다. 1980년 대만에 유학 갔고, 공주사범대를 거쳐 전북대 중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2021년 정년퇴임을 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제1회 원곡서예학술상을 받았다.
왜 『논어』였나.
“공자는 평범한 이들과 같이 살며, 그 평범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평범한 말로 이야기했다. 그 평범함을 전해드리고 싶었다.”
3년 가까이 주 2회 신문 칼럼으로 『논어』를 연재했다.
“새벽 서너시에 일어나서 글을 고르고 620자 짧은 에세이를 썼다. 아침에 경서(經書)를 쓰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다. 원고가 6편쯤 쌓이면, 날을 잡아 붓으로 썼다.”

연재하는 동안 기억에 남은 날은.
“현실의 분위기는 참고했지만, 특정 사건과 연결한 글은 없다. 다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은 풀이다(君子之德風 小人草)’를 쓸 때는, 잘못된 리더들을 만난 탓에 사람들 마음이 사나워져 안타깝다는 마음을 담았다.”
한자도 잘 모르고, 손글씨도 잘 쓰지 않는 시대에 왜 서예일까.
“그럴수록 서예를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예수님·부처님·공자 등 인문학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껏 버티지 못했을 거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어도 인류의 정신을 청정하게 유지해 준 건 그들이 남긴 말이다. 그리고 서예는 그 말들을 쓰는 예술이다.”
인문학과 서예가 어떤 연관성이 있나.
“말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서예는 순간의 예술이다. 필획은 수정할 수 없기에 서여기인(書如基人), 글씨는 그 사람이라고들 한다. 부드러운 붓에 먹을 찍어 써야 하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자기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 나를 잊고 집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 서예가 왜 쇠퇴했을까.
“한자를 쓰지 않아서다. 한자도 안 쓰는데 왜 서예를 하냐고들 한다. ‘한자는 어렵다’‘한글이라는 좋은 글자가 있는데 왜 한자를 섞어 쓰냐’ 그렇게 국민이 세뇌되어 있다. 우리말에 한자어가 70% 가까이 되는데, 한자를 안 가르치니 어휘력·문해력이 떨어진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필수한자 3000자 가르치자. 애들에게 학습부담 주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영어단어 외는 것에 비할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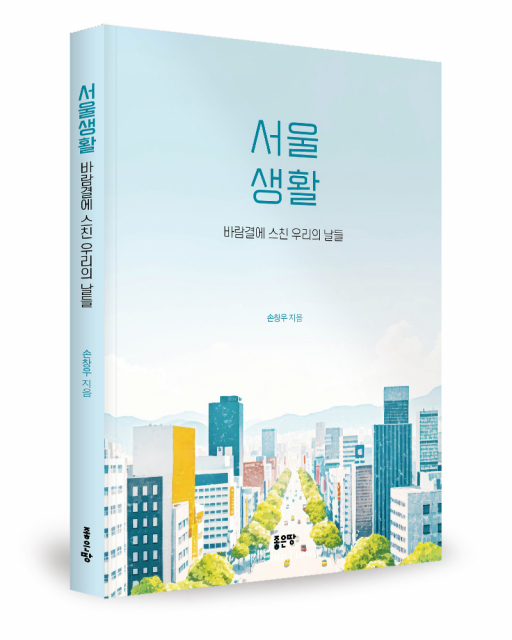

![[신간] 안귀옥 변호사, 30년 법정 사연을 담은 '시간의 기록'](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7521817438_f713f2.jpg)

![[홍장호의 사자성어와 만인보] 궁달득상(窮達得喪)과 증공(曾鞏)](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16d8be22-50d4-40ab-9157-0eb9cdcd4ccc.jpg)


![[신간] 시대의 징후를 포착하다... 비평집 '어떤 사랑의 무대'](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8055869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