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위탁생산지를 중국에서 인도 등 '중국 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급형 스마트폰 '합작개발생산(Joint Developing Manufacturing·JDM)' 협력사로 중국 업체를 대체할 곳을 물색 중이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JDM 물량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로, 삼성은 특히 인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JDM 이전을 위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생산능력과 기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초기 구상 단계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생산의 일종인 JDM은 주문자(삼성전자)와 제조사가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은 제조사가 맡는 걸 뜻한다.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모두 전문 생산 업체에 위탁하는 '제조자개발생산(ODM)'과는 다르다. JDM은 생산을 협력사에 맡기는 만큼 고정비 부담을 줄여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주문자가 설계와 부품 선정에도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 등 전략 제품은 직접 생산하지만, 신흥 시장을 겨냥해 출시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은 JDM 방식을 택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윙텍, 화친, 룽치어 등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JDM 협력사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연간 판매량의 약 20%를 JDM으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JDM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옮기려는 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소비재는 예외로 했지만, 최근 조치로 스마트폰에 대해 처음 관세가 적용됐다.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데, 이런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면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규제와 관세 부과는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위탁생산 업체 중 하나인 윙텍은 지난해 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생산 관련 사업을 다른 중국 스마트폰 조립 업체인 럭스셰어에 매각하고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럭스셰어는 대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 리스크도 있는 만큼 인도를 유력 후보지에 올려 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재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 집중된 현재 스마트폰 생산 체계도 인도로 상당 부분 분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GAM]AI 시대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① 디바이스 진화 불가피, 왜](https://img.newspim.com/news/2025/02/18/25021802310817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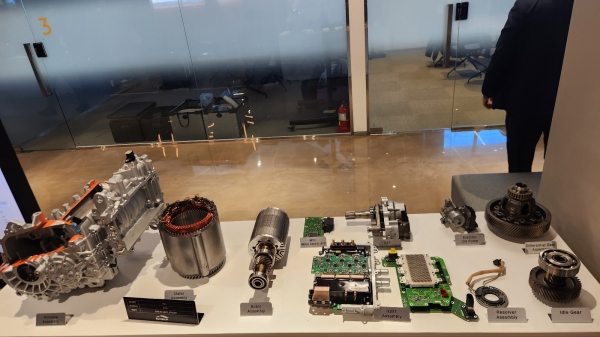


!['갤럭시Z 폴드7도 더 얇아진다?' 삼성·애플 슬림폰 전쟁 [영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8/news-p.v1.20250218.81056b162d8a4cecb19d5d164b1c4007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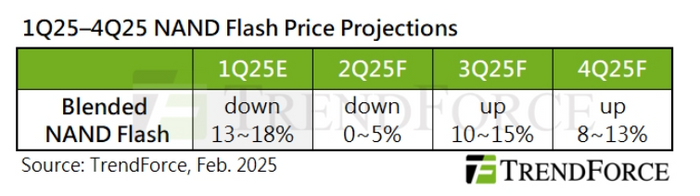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개막·AI 전력망 투자 본격화… 첫 발 뗀 한국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8/2GP0NC9LP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