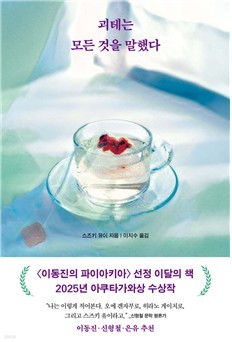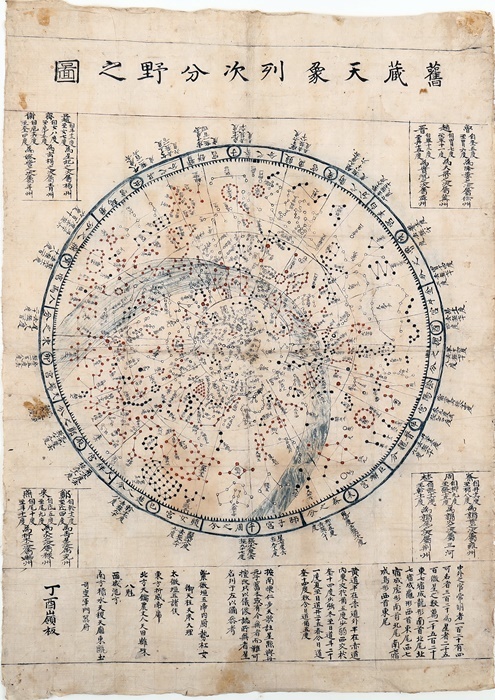국내 첫 논픽션 도서전 ‘디스이즈텍스트’ 기획·준비하는 세 명의 편집자
시간제한으로 제대로 된 소통…“긴 호흡으로만 살필 수 있는 영역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무려 15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유명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인기를 끈 굿즈는 빠르게 ‘완판’됐다. 대형 출판사 부스들은 이벤트를 마련해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축제’는 말 그대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외면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책보다 굿즈나 행사가 주목받는 상황, 일부 장르 쏠림 현상 등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많은 인파 속에선 정작 책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기도 어렵다.
색다른 도서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왕이면 진짜로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국내 최초의 논픽션 중심 도서전인 ‘디스이즈텍스트(this is text)’를 기획, 준비 중인 세 명의 편집자이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송찬, 김미선, 오주연씨를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책이라는 매체는 오늘날 ‘비효율적’이다. 원하는 것을 챗GPT처럼 단번에 제공해주지도 않고, 책에 없을지도 모르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읽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제대로 읽기 위해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서사적 재미도 부족한 논픽션은 오늘날 도서 생태계에서 가장 뒷단에 있는 장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기획 과정은 이 시대에 ‘왜 굳이 비효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이어진다.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 예정인 ‘디스이즈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논픽션 북페어’라는 점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 모집 공지문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철학, 역사 분야의 인문교양 단행본만 판매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굿즈, 문학, 실용서, 자기계발서 등은 취급 불가다.

오주연 편집자는 “그간 국제도서전뿐 아니라 다양한 북페어에 참여했는데, 북페어에서는 통상 복잡한 텍스트보다는 그림책이든 문학이든, 좀더 설명하기 쉬운 텍스트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눈에 내용을 알기 어렵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논픽션은 도서전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서 “(다른 장르를 배격한다기보다는) 그간 도서전에서는 극히 소수였던 논픽션, 텍스트를 중심에 두는 기획을 추진해보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굿즈 판매를 금지한 것 역시 독자와 출판사 모두 텍스트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다. 김미선 디스이즈텍스트 사무국장은 “도서전에서 굿즈가 필수였던 건 아닌데 코로나19 이후, 2023년쯤을 기점으로 굿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엽서 같은 건 거의 필수가 됐다”며 “소규모 출판사, 1인 출판사들은 굿즈를 제작하는 데도 부담이 크다. 굿즈에 주목할 시간에 텍스트에 주목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서는 ‘시간적 비효율’ 역시 필요하다. 디스이즈텍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 예약제·정원제’로 운영한다는 점인데, 하루 70분씩 다섯 타임으로 나눠 한 타임당 입장객을 최대 6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오 편집자는 “대형 도서전에서는 출판사 관계자도, 독자도 깊이 있는 텍스트를 마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짧은 순간만큼이라도 책을 충분히 소개하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송찬 편집자는 “도서전의 묘미는 타인의 큐레이션을 통해 그곳에 가서 ‘몰랐던 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예스24에서 하는 ‘책아 미안해’(좋은 책인데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주목받지 못한 책을 모은 기획) 같은 게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통상 도서전 판매 목록에선 신간, 한정판 등이 주를 이루지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고 출판사에 각별한 책이라면 출간된 지 몇 년 된 책들도 큐레이션에 포함된다.
미국의 서점체인 반스앤드노블은 온라인 시대에 직접 종이책과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서점을 확장하고 있다. 한때 폐업 위기에 내몰렸던 반스앤드노블은 2025년 기준 미국 전역에 약 700곳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편집자는 “SNS 등에 광고성 게시물이나 AI 생성물이 많아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대면 경험에 대한 추구가 늘고 있다. 대규모 마케팅보다 소규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효율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게 무얼까 생각해보다 텍스트 중심, 시간제한 등의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논픽션 인기가 나날이 떨어지는 요즘 상황에 대해 ‘생태계’라는 키워드에 주목한다. 오늘날 논픽션을 둘러싼 독자, 출판사, 리뷰어, 서점, 저자, 편집자 등의 생태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픽션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편집자는 “과거에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책을 읽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새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서로 같은 책을 읽고 공유하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며 “논픽션 독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결국 어떤 것들을 깊이 공유하는 생태계 자체의 소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쓰는 사람은 독자를 상정하고 ‘말 걸듯’ 쓰지 않고, 잘 쓴 논픽션 책이라도 딱히 주목받지 못한 채 연간 6만여종씩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사라질 뿐이다. 이는 전문가나 학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SNS에서도 ‘어떤 책이 좋대’라는 간단한 추천은 많은데, 어떤 책을 직접 읽고 쓰는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잘 쓴 리뷰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리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왜 여전히 긴 호흡의, 비효율적인 읽기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이들은, 긴 호흡으로만 비로소 살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편집자는 “논픽션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게 있어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깊이 있게 누군가가 대신 설명해준다는 점이 매력적인 장르”라며 “공동의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간편하게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세계와 소통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편집자는 이런 소통을 위해 독자와 저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진짜 읽기의 경험을 어떻게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걸 오늘날의 방식으로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외부와 계속 섞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북페어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바깥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함께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