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2025년 현재, 연간 약 1만5000명,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어떤 특별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다. “한국 사회는 너무나 살기 어렵다.” 치열한 입시, 무한 경쟁,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부동산, 일자리, 관계, 돌봄… 그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쉼과 여유, 포용의 여지는 찾기 어렵다.
‘살아남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을 점점 고립된 개인으로 몰아간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다. 누군가 무너질 때, 그를 잡아줄 공동체의 손길이 사라진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한 40대 가장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정규직에서 해고된 뒤 치솟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남긴 메모에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경쟁과 자본의 논리로만 설계된 구조를 다시 사람 중심으로 재편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를 마치 절대 진리처럼 숭배해 왔다. ‘성장’, ‘성과’, ‘효율’이라는 말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거리, 빠른 자와 느린 자의 간극,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무정한 칼날 앞에 수많은 이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복지나 정책 이전에 삶의 철학을 바꿔야 할 때다. ‘국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가장 앞에 놓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 느린 사람을 기다리는 인프라, 나약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복지, 말할 수 있는 공간, 들을 수 있는 귀, 이웃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마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시작점이다.
복지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존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다. 정책의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공존이어야 한다. 국가는 경쟁의 심판자가 아니라 돌봄의 동반자여야 한다. 매년 도시 하나만큼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성장이 아니라 삶, 속도가 아니라 존엄,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이다.
이제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지기 위해서.
명본 스님 (사)울산그린트러스트 공동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ON 선데이] ‘영포티’ 조롱잔치는 어디서 시작됐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10/18/ac0f1678-acba-4ca4-a452-192e0b8670d7.jpg)
![기후위기 비관론에 빠지는 대신...데이터가 알려주는 현황과 성과[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a1f6c592-a63e-481a-a084-2171a38b7ff6.jpg)
![[기자수첩] 잔인한 금융](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760_1760664531_m.png)
![추구하는 가치와 '질문'으로 엮은 미국 명문대 탐방기[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cf59d45d-e14e-468e-bc37-312e981f08d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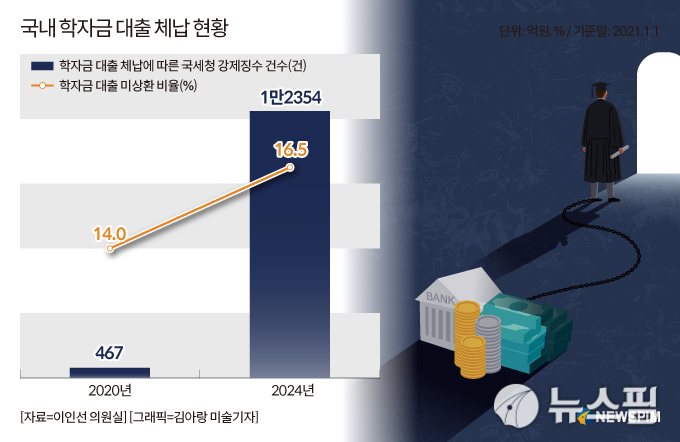
![예수의 시적 언어를 곱씹어 풀어 쓴 ‘삶의 지혜’ 문장들 [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192ef400-2a4d-4484-9104-d217e6b7a798.jpg)
![[기재위국감] 임이자 “AI만큼 중한 인사혁신”…뿌리 깊은 국세청 인사차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993201664_79cd6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