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으로 영국에 나가 사는 지인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쓴 보고서를 공유해 주었다. 교실에서 짝꿍과 실로 만든 종이컵 전화기 실험을 하고 쓴 보고서는, 내용만 보면 특별할 게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실험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한 대목은 놀라웠다. 초등학생이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논리정연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초등학생도 3학년 때 실 전화기 실험을 배운다. 학교 상황에 따라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험의 의도와 결과,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교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단원평가’라는 이름의 객관식 문제를 풀었으리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에서 관련 평가 문항을 내려받아봤다. 실 전화기에 관한 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과 실험 과정을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좋은 교육일까?
영국 아이가 쓴 보고서와 한국 아이가 푸는 문제를 보며, 국제학교 심층 대해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양육자들이 떠올랐다. 이들은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객관식으로 평가해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한국 교육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필고사 폐지 등으로 학습 기능이 약해진 초등학교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이 학력 인증도 되지 않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택한 건 “그럼에도 아이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제학교 인기의 이면엔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공교육이 싫다고, 누구나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다수 양육자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남아 울며 겨자 먹기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선행학습 경쟁을 시작한다. 설령 운이 좋아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초등학생 때부터 보고서를 쓰며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한 영국의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국제학교를 취재하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기자들도 “국제학교 못 보내고 공립초에 보내는 무능한 부모”라며 자조했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기자들의 얼굴 위로 “한국 경제가 반등하려면 모방형 인재가 아니라 창조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하던 경제학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쥔 건 학교가 아닐까.
![[설왕설래] 개구리 해부 금지](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30/20250330510527.jpg)

![[전문가 칼럼] 고립·은둔 청소년과 최면심리 치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4006610244_4780c7.jpg)

![[에듀플러스]〈칼럼〉교육자원의 결핍, 그리고 에듀테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8/news-p.v1.20250328.bfce91b818dc48d9acbd2c3572676bbb_P3.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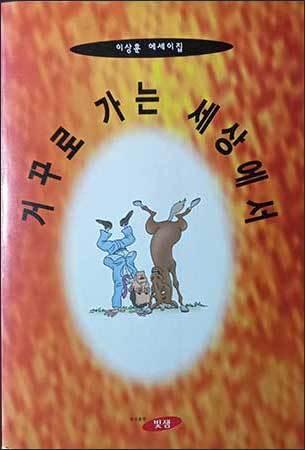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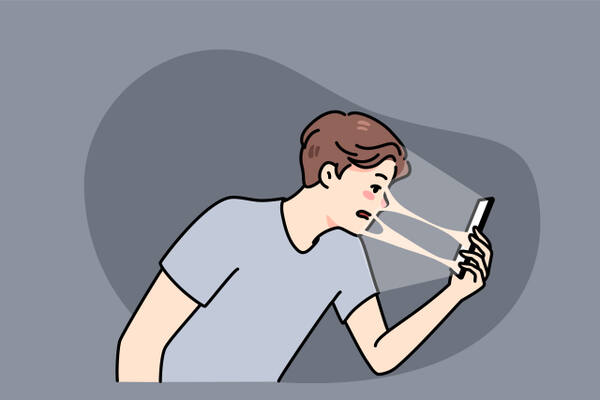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불러주는 말과 받아쓰는 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3080454081_ddde5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