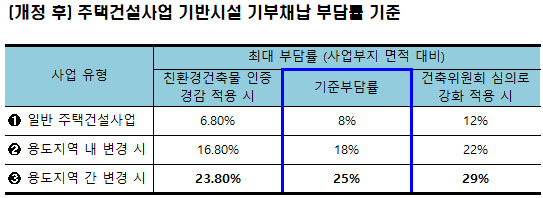한국의 전세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제도로서 교차담보 구조를 활용한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담보로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식이다.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전세는 효율적인 금융계약이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개인 간 자금 거래는 신용 위험이 높아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필요하지만, 전세는 은행 없이도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갭투자와 깡통전세 위험 반복
전세대출 줄이고 보증도 축소
전세금, 집주인 DSR에 넣어야
201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벵트 홀름스트룀 MIT대 교수는 ‘전당포 금융’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담보의 가치가 대출액보다 충분히 높을 경우 정보비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금융시장이 미성숙하던 시기, 전세는 은행대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차입자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주거 서비스의 대가인 월세와 자금조달의 대가인 이자를 서로 주고받지 않고 상계함으로써 거래비용과 마찰도 줄어든다. 김세직·신현송 교수는 이러한 전세의 장점이 저축과 투자 증가를 유도해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세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전세가격보다 주택가격이 충분히 높아야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금을 맡길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가 늘어나던 과거 한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이를 쉽게 충족할 수 있었다. 한편 집값의 지속적 상승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집주인이 안정적인 월세 수입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저성장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변화가 전세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역전되는 지역에서는 전세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에서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빈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주택시장 양극화와 가계부채 증가 불러
통계를 봐도 전세 비중의 하락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 거래 비중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2021년 43%에서 지난해 57.4%, 올해는 62.6%까지 치솟았다.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여전하다. 전세를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좋다. 수익성이 높으니 투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자금조달도 더 쉬워진다. 결국 전세제도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갭투자의 과정에서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사금융으로 기능하며 가계부채로 연결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전세금을 포함하는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한다. 결국 전세가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는 과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진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한때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세금 반환 불안과 보증 사고, 가계부채 확대 등 사회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전세의 역기능을 제어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전세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전세대출이 본래의 주거 안정 목적을 넘어 갭투자의 자금원으로 악용되면서 제도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나아가 전세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형식상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입금과 다르지 않다. 이미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으로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보증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보증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임차인의 계약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자기부담비율을 도입하거나, 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주택의 양도나 담보 설정 등을 임차인에게 빨리 통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금 신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신탁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월세공제 확대 등 세입자 보호도 필요
전세제도는 한 시대의 산물이다. 한때 전세는 부족한 금융시장을 대신해 자금이 돌게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의 저성장·인구감소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는 월세화의 진전에 맞춰 월세 보조금이나 월세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전세 없이도 서민층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세 축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제도의 퇴장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전세의 시대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할 똘똘한 한 채"…대출 조이자 꼬마빌딩 꿈틀[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UEPZW_5.jpg)
!["높은 수익률·선순위 안전성 확보…유럽 부동산 투자 최적 시기 왔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P7FDHU_1.jpg)
![[단독]집값 뛰자 '부모 찬스'도 늘었다, 서울 1년새 2배 급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4/2ffc9267-54f9-45b7-9bdd-c8f2f87f6323.jpg)
![공시가율 또 동결…집값 급등에도 세금은 ‘제자리’인 이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18WWT_1.jpg)
![[황정미칼럼] 머니 무브의 종착지는?](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75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