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브랜드 구찌 등을 소유한 프랑스 럭셔리 그룹 케링(Kering)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명품 산업 전반의 성장 정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링은 상반기 그룹의 순이익이 4억7400만 유로(약 76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억7800만 유로(한화 약 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46% 급감한 수치다.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76억 유로(약 12조1000억원)에 그쳤다.
간판 브랜드 구찌의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 구찌는 상반기 30억 유로(약 4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26%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링의 부채 규모는 100억 유로(한화 약 16조원)를 넘겼고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케링의 주가는 약 70%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10억 유로(약 33조7000억원)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브랜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찌 디자인 총괄을 교체하고 프랑스 르노 출신 루카 데 메오를 신임 CEO로 영입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품 업계의 침체는 케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루이비통, 디올 등 주요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역시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패션·가죽 제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9% 감소했다. LVMH는 수년간 명품 업계의 '무적함대'로 불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이번 실적은 업계 전반의 위기 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명품주의 회복을 수년간 기다려온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품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핵심 배경에는 소비 세대의 변화가 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가 명품에 대해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 선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요 고객층이 이탈하고 있다.
브랜드의 과도한 가격 인상, 과잉 마케팅, SNS 기반의 '과시형 소비' 유도 전략은 오히려 소비자 피로감을 불러왔다. 브랜드의 희소성은 떨어졌고,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 이른바 '듀프(Dupe, 고가 브랜드 제품을 흉내 낸 저가 대체품)'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프랑수아 앙리 피노 케링 회장은 "오늘의 수치는 아직 그룹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은 케링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반등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MZ세대의 소비 기준이 '브랜드'보다 '가치'와 '경험'으로 이동한 만큼, 단순한 디자인 교체나 유명 인사의 기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10년간 50% 이상 고속 성장해온 명품 산업이 이제는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명품 브랜드가 지나치게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신 제품보다 '희귀한 빈티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추세"라며 "이제 명품 브랜드는 정체성과 소비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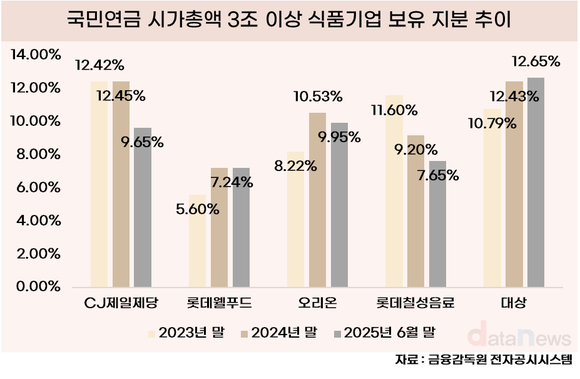



![[GAM]애플 테마주 '가이'② 자회사 홍콩상장에 불거진 3대 우려감](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0352401761.jpg)

![6분의 1로 떨어진 몸값…잘나가던 3대 수제 맥주 어쩌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PCMTN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