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영국 정부는 고독(외로움)을 공중 보건 및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2018년부터 '고독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리학자들 또한 오래전부터 고독의 심리적·신체적 영향에 주목해 왔고, 그 결과 고독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가 바로 UCLA 고독감 척도(UCLA Loneliness Scale)이다.
이 척도는 197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심리학자 대니얼 러셀(Daniel W. Russell)과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초기 버전은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문항의 어휘와 구조를 간결하게 다듬은 개정판이 두 차례 발표되었다(1980년 2판, 1996년 3판). 현재는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이 연구와 임상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UCLA 고독감 척도는 고독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척도의 문항은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와 같이 일상적 경험을 묻는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선택한다.
이렇게 산출된 총점은 고독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강하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척도가 ‘당신은 외롭습니까?’와 같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나 방어적인 대답을 피하고, 보다 은밀하고 정확하게 내면의 상태를 포착하기 위한 의도다.
고독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고독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감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Holt-Lunstad et al., 2015; Russell, 1996). 특히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중심의 관계로 전환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고독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고독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
UCLA 고독감 척도는 단순히 ‘외롭다 / 외롭지 않다’라는 이분법을 넘어, 고독의 정도를 연속선상에서 정량화함으로써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 전후의 점수를 비교하면 개입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세대의 고독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척도가 그렇듯 UCLA 고독감 척도에도 한계는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맞춰 답할 경우, 실제 상태와 점수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점수만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심층 면담이나 다른 심리검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화적 차이도 중요한 변수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긍정적 자율로 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결핍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해석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문화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고독감 척도는 단순한 설문지가 아니라, 마음의 체온을 재는 도구다. 체온계가 열을 알려주듯, 이 척도는 마음의 온도가 너무 내려가고 있음을 경고한다. 온도를 알았을 때 우리는 난방을 켜거나 이불을 덮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UCLA 척도가 의료·복지·교육, 치유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척도를 실시해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고독 수준을 파악해 멘토링·동아리 연결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일부 연구팀은 UCLA 척도를 모바일 앱에 탑재해 실시간 자가 점검과 온라인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척도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고독은 측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은 감정이기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관계를 확장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늘리는 노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심리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치유농업 또한 고독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도 UCLA 고독감 척도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치유농업이 고독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다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UCLA 고독감 척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53-80.
Russell, D.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20-40.
Holt-Lunstad, J., T.B. Smith, M. Baker, T. Harris, and D. Stephenson,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227-237.





![[에듀플러스]“국·수 위주, 내신 반영 낮아… '교과형 논술'이 뜬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f2149bee54dc42fb98c44164f7b3ae71_P1.jpg)
![[과학자의 컬러심리 톡] 색채의 연령별 특징](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14/p1065568873104674_670_thu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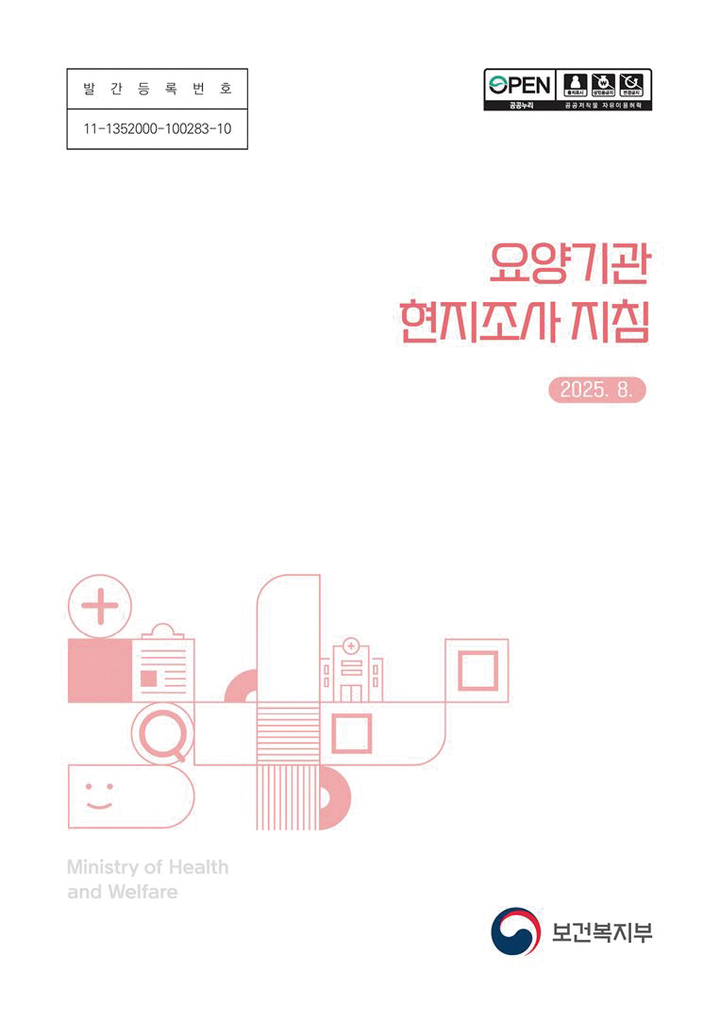
![[한국에살며] 예의? 수락? 외국인이 헷갈리는 한국어 반응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519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