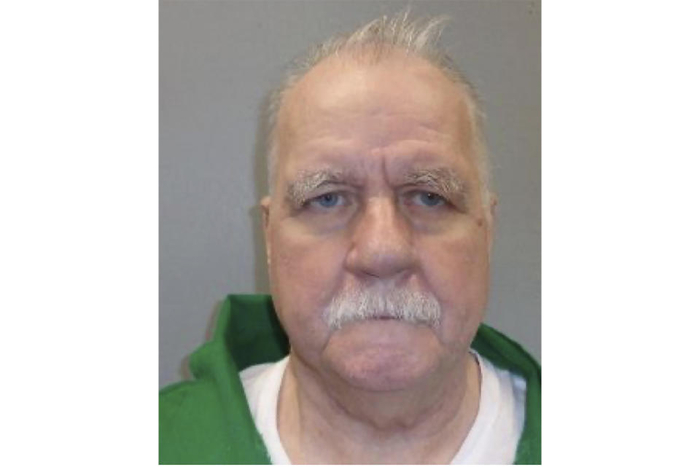출산 전후 외국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었을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 B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으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 선택 불가, 외국국적 미포기’를 이유로 신고가 반려당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자신의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 후 자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모친은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 미국에 간 적이 없었다. A씨는 2003년 7월경 출산 전후 약 한 달 반 가량을 미국에 머물렀으며,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다가 2010년 5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복수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