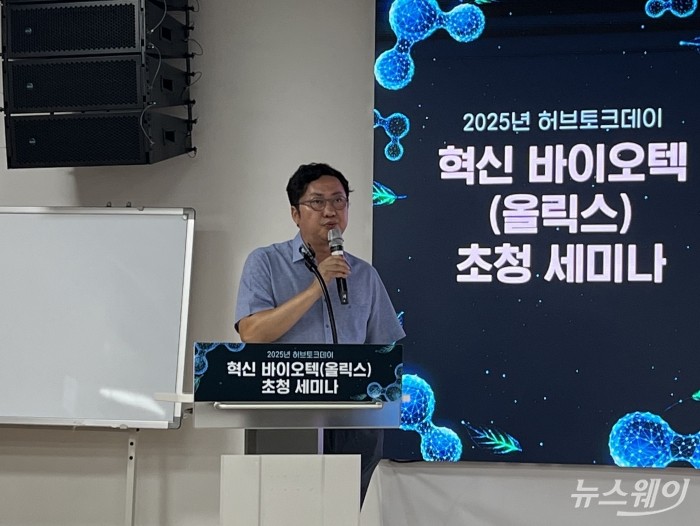바이오 산업에서 특허는 양날의 검이다. 단 하나의 특허로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만 특허 분쟁 이슈가 터지는 순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신뢰가 와락 무너진다. 칼을 잘 갈고 닦으면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방심하는 순간 기업 스스로를 찌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인투셀(287840)이 대표적이다.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력을 인정받아 주가가 공모가의 3배가 넘는 5만 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특허 침해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해 현재 2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바이오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에는 공통된 공식이 있다. 탄탄한 특허 장벽을 세워두었다는 것. 글로벌 제약사들은 기술 도입 전 계약 상대방의 기술에 대한 특허 조사에만 수억 원을 쓴다. 취재 중 만난 한 바이오 특허 전문 변리사는 “특허 전략이 없는 바이오 기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바이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특허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다. 특허 출원 문서를 제출하기 전 실험실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수출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특허팀과 함께 특허를 받기 유리한 발굴·임상 방향을 논의한다.
문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바이오 기업들은 특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손놓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만 해도 건당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등 고정비도 만만치 않다. 호흡이 긴 특허 절차상 출원 준비에만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임상 자금 조달에도 허덕이는 바이오 기업이 특허 관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가 초기 바이오 기업의 특허 관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분야보다 ‘특허 전쟁’이 살벌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일회성 자금 지원보다 컨설팅부터 서류작업까지 단계별 지원이 절실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K-바이오 특허 ②] 기업 혼자는 어렵다 '특허 매핑' 지원 절실](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94-73678-sample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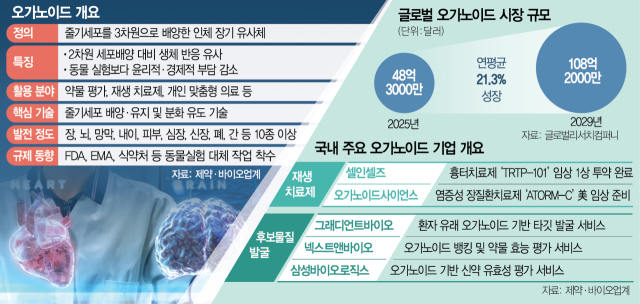

![[ET톡]비만치료, K-바이오의 도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9/news-p.v1.20250819.dedb4345e1e0480dba97436f28273986_P1.jpg)

![[기고] AI거품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082910566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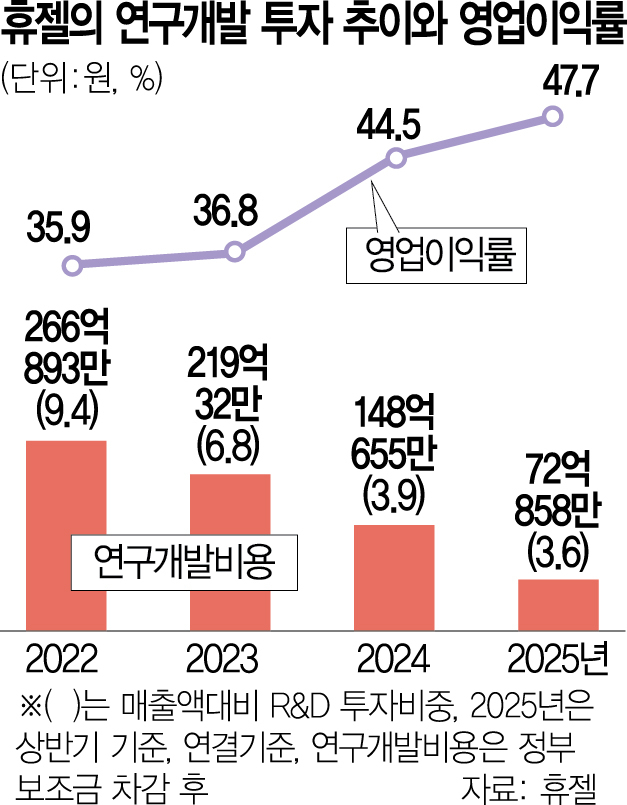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글로벌 의료AI 경쟁력, 신속 시장 진입·연구 생태계 조성 시급](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85471eb8f2154ebfa67a2cfe6f420149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