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등의 수식어가 수시로 따라다닌다. 정부가 2011년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0년 넘게 지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으로 꼽힌다.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한 주 평균 42.2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평균 241만원을 수령했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28.7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143만원을 받았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337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평균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은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도 많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인력 기준과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 중앙·지방 정부의 단기성 사회복지사업으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일자리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낮은 고용 안정성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업계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직장 내 부조리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 51.8%, 따돌림·차별 41.2%, 부당 지시 34.8%, 폭행·폭언 31.6%, 업무 외 강요 23.4% 순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시설장,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가 45.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 24.7%, 비슷한 직급 동료 14.2%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49.8%)이 ‘시설장의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운영’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경직된 조직문화(39.4%), 상시적 인력 부족·낮은 처우 등 열악한 업무환경(38.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 환경은 열악한데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노조가입률은 2%로 나타났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결정적인 원인은 작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평균 11.36명이었다.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한 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예도 많았다.

!["빅4 채용 줄인다" 더 좁아지는 회계사 취업문…로스쿨은 전문·실무교육 실종에 '변시 학원' 전락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G2N68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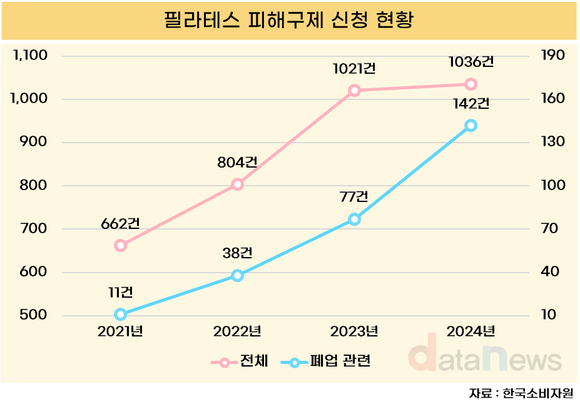
!["직장 내 괴롭힘,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이통 3사, AI 산업 생태계 확장 경쟁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JXNJVG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