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은 멈추지 않는다
나의 동지, 영일만 사나이들①

포스코는 사람들의 작품이다. 숱한 인재들의 피와 땀으로 포스코 신화는 탄생했다. ‘고참’ 순으로 짚어나가면 고인이 된 고준식, 요즘도 가끔 만나는 황경노부터 꼽아야겠다.
나와 고준식은 1956년 국방부에서 처음 만났다. 육군 대령인 내가 인사과장이고, 공군 대령인 그는 물동과장이었다. 그는 수학적 머리가 비상했다. 복잡한 결재 서류도 쓱 살펴보면 잘못된 부분을 족집게처럼 집어냈다. 빵빵한 체격에 말씨도 빨랐다. 65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갔을 때, 고준식이 전무이사로 앉아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여섯 살 위였지만, 우리는 동지요 친구였다.
그는 누구보다 두뇌 회전이 빨랐다. 67년 런던 출장길에 ‘포철건설추진위원장’에 내정돼 귀국해 보니, 고 전무는 일찌감치 황경노를 중심으로 종합제철 실무팀을 짜놓고 기다렸다.
이듬해 우리는 영일만으로 옮겨갔다. 1만 쪽이 넘는 방대한 일반기술계획(GEP) 검토나 대일 청구권 자금에 얽힌 실무는 온통 고준식 몫이었다. 하나같이 고달프고 골치 아픈 일이지만 그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절묘한 콤비였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내가 정면에서 대들면 늘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뒷말을 잠재운 것은 고 전무였다. 나는 싸우고, 그는 달래는 격이었다. 포스코의 안살림을 맡은 그는 큰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엄청 속을 썩였을 것이다.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81년 3월, 나는 회장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고준식에게 사장자리를 물려주었다. 내가 정치에 바빠 포항을 비워도 그가 있으면 언제나 듬직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포스코를 세우면서 너무 속을 끓였기 때문일까. 고준식은 85년 3월 건강 문제로 포스코를 떠났다. 그의 고별사는 포스코 사나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포철에 처음부터 동참할 수 있어 내 일생의 영광이고, 이를 자손들에게 떳떳한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그의 고별사는 결국 유언이 되었다. 그가 숨을 거둔 91년 4월 28일, 나는 평생의 동지를 잃은 허탈한 느낌이었다.
나보다 세 살 아래인 황경노는 54년 육사에서 처음 만났다. 내가 교무처장이고, 그는 교무과장이었다. 그는 어떤 보고서를 올리든 손질할 데가 없을 정도였다. 미 육군경리학교도 다녀온 엘리트 회계 장교였다. 대한중석 사장으로 가면서 나는 평소 눈여겨 둔 그를 군복을 벗겨 데려갔다. 대한중석이 1년 만에 흑자로 바뀌고 탄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그의 공로가 컸다.
황경노는 포스코 관리부장을 맡아 훌륭한 경영자로 뻗어나갈 자질을 보였다. 마흔도 안 된 나이에 회사 전체를 통찰하면서 무리 없이 조정·통제해 내는 경영 관리의 수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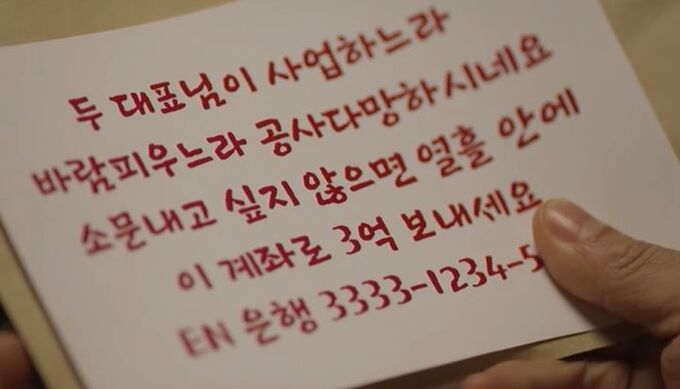
![[세종25시] 용산 '난파선' 탈출하는 정부부처 과장들](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1202886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