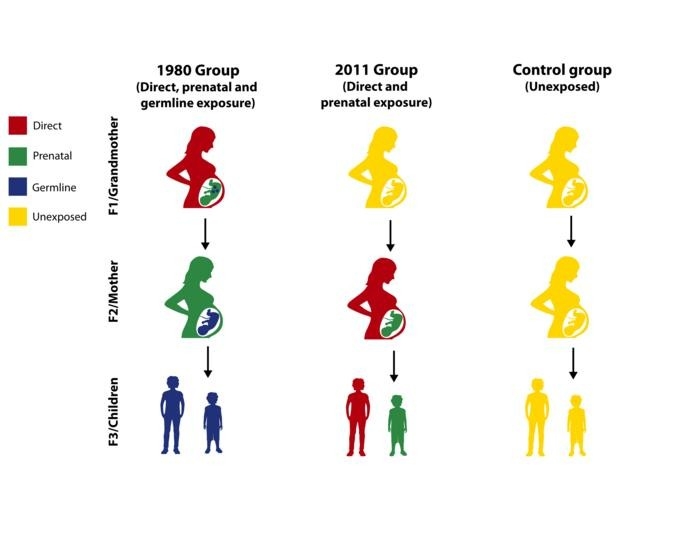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국장을 만나 산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지난겨울 산양 1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데 산양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산양이 누구인지에서부터 인터뷰를 시작했다. 정인철은 한국에서 산양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다. 지금은 새벽 4시 서울을 떠나 산양이 있는 설악으로 가는데, 머지않아 그쪽으로 터전을 옮겨 본격적으로 산양을 연구할 생각이란다.
“산양은 양이 아니에요. 솟과거든요.” “산양이 소라고요?” “솟과로 분류되었을 뿐 소는 아니죠.” 그는 산양이 그려진 로드킬 경고 표지판을 내밀었다. “이 그림도 산양이 아닙니다. 이건 염소예요.”
갈수록 난관이었다. 내가 모르는 건 산양뿐만이 아니었다. 양도, 소도, 염소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본 게 전부였으니까. 양의 털은 구불거리고, 염소는 수염이 있으며, 소는 눈이 크다는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게다가 살아 있는 산양이라면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처음 본 산양은 죽은 산양이었다. 인간이 설치한 울타리 때문에 굶어 죽은 1000마리 산양의 사체였다. 털과 가죽,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은 해골의 모습으로 산양을 처음 만났다.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새들과 태즈메이니아 해변에서 떼죽음을 당한 돌고래들, 수십 장의 비닐봉지를 삼키고 쓰러진 코끼리들.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은 동물의 사체를 보았고 이제 슬픔조차 느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산양이 집단학살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산양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 1965년과 1967년에 내린 폭설을 피해 산양이 마을로 내려오자, 먹잇감으로 인식된 산양 6000마리가 사람의 몽둥이에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 1968년에 산양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집단학살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삼겹살을 계속 먹기 위해서 산양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보호하려면 멧돼지와 격리해야 한다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멧돼지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삼겹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산양의 죽음을 못 본 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 직군에서 일하는 한기박씨는 야근하던 선배가 쓰러진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 또한 과로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산양의 해골을 못 본 척했고 고래 떼의 사체 앞에서 침묵했던 인간은, 이제 자기 앞에 쓰러진 같은 인간에게조차 아무 손을 쓰지 못한다. 누가 죽든 말든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는 쳇바퀴 위에서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것, 자기 자신의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저 달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계에서 허락받은 유일한 자유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중에서)




![[견주 일기] 개 산책 중 만나는 낯선 존재들](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7/p1065621106954118_740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