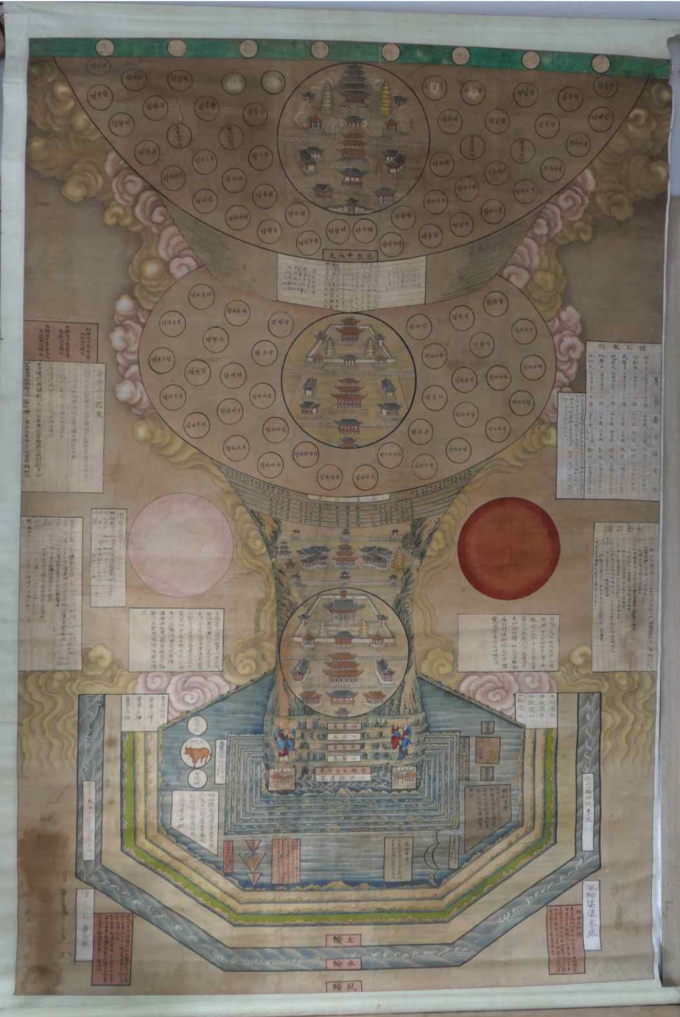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1·2
김상봉 지음
도서출판 길 | (1·2권 도합) 1932쪽 | 20만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12권에 대한 주석서를 내놨다. <형이상학> 12권 원문은 20여쪽에 불과하나 김 교수의 주석은 2000쪽 분량이다. 서양 고전철학 전공자인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서평을 싣는다. <편집자 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그려진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세상을 등지고 웅크린 채 생각에 잠긴 철학자. 실제로 이 철학자는 속세를 떠나 은둔의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나 자신을 탐색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극단적인 형태로 투영된 존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다. 이 신은 세계 밖에서 생각에 몰두한다. 그는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순수 정신으로서 생각에 몰두하지만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신은 “생각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영원한 자기 관조다.
이런 신이 <형이상학> 제12권에 담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의 주인공이다. 신학적 논의가 짧은 것은 신에 대한 앎의 한계 탓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앎은 사실의 확인과, 확인된 사실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서 성립한다. 설명에 필요한 원인과 근거는 탐구와 발견의 대상이지만, 발견 내용의 참·거짓은 경험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한다.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학이 만족시킬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 즉 세계의 운동과 지속적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요청된’ 원리에 대해 짧게 이야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이 짧은 강의에 대한 긴 주해다. 전체는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개념이 소개되고 형이상학의 주요 내용들이 거론된다. 2부는 <형이상학> 제12권의 그리스어-한글 대역이다. 저자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은 3부의 주석이다. 신의 도입 배경이 어떤 것인지, 신이 왜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현실태”인지, 정신으로서 신의 현실태가 왜 자기에 대한 생각인지, 신과 세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이 핵심 문제이다.
저자는 몇 가지 주장을 반복한다. 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하나 속에서 전체를 사유하는 학문이다. 형이상학의 이런 성격은 존재론과 신학의 이중 구조에서 드러난다. 형이상학은 존재 일반의 근거를 묻는 존재론인 동시에 그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 신학이다. 이런 “존재-신-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은 곧 “정신의 형이상학”이다. “신적 정신의 자기의식이 모든 것의 근거”(Ⅱ:669)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형이상학>의 신학을 근대 독일 철학의 자기의식 이론과 결부시킨다. 저자의 칸트 연구서 <자기의식과 존재사유>의 제목을 빌려 주석서 전체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존재사유에서 시작해서 신적인 자기의식에 대한 분석으로 끝난다.’
헤겔의 정신이나 칸트의 통각과 비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 이 신은 물론 자기를 외화하는 주체도,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도 아니다. 그에게는 자기 부정성도, 시간성도 없고, 구성을 위한 형식도, 재료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신의 영원한 활동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세계에 작용할 뿐이다. 신 혹은 신적인 자기의식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저자는 이런 점들을 “‘처음’이 안고 있는 한계”(Ⅱ:666)로 여긴다. 그럼에도 저자가 <형이상학>의 신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처음’이 마지막 완성을 자기 속에 품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처음”이고 독일 관념론이 “완성”이라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실체론과 신학의 관계, 신과 세계의 관계 등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는 따져볼 점이 많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논쟁거리는 해석 전체의 배후에 놓인 ‘목적론적 관점’일 것이다. 병아리를 그것의 ‘완성’(telos), 즉 닭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목적론’(teleology)이다. 하지만 헤겔의 정신철학이 닭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은 병아리인가? 저자는 이 ‘병아리 신학’에 “신적인 자기의식의 현상적 전개”(Ⅱ:666)에 대한 논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신의 작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키워 보려고 하지만(Ⅱ:766 이하) 성공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은 신에 대해 ‘외화’나 ‘구성’ 같은 종교적·인간학적 상상을 거부하는 ‘미니멀리즘의 신학’이며, 세계로부터 신으로의 길에 대해 말하지만 그 반대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철학에서 신이 사라진 시대에 신학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 해석은 뜻있는 일이다. 독일 관념론과의 비교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론의 틀에 갇혀 있는 한, 공들인 2000쪽의 주석이 원문 20쪽의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다. 두꺼운 주석서를 읽으면서 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언과 침묵, 여러 주석가의 의견들, 저자가 “자기 방식으로 이해”(Ⅰ:10)해서 덧붙인 주장들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현명한 독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