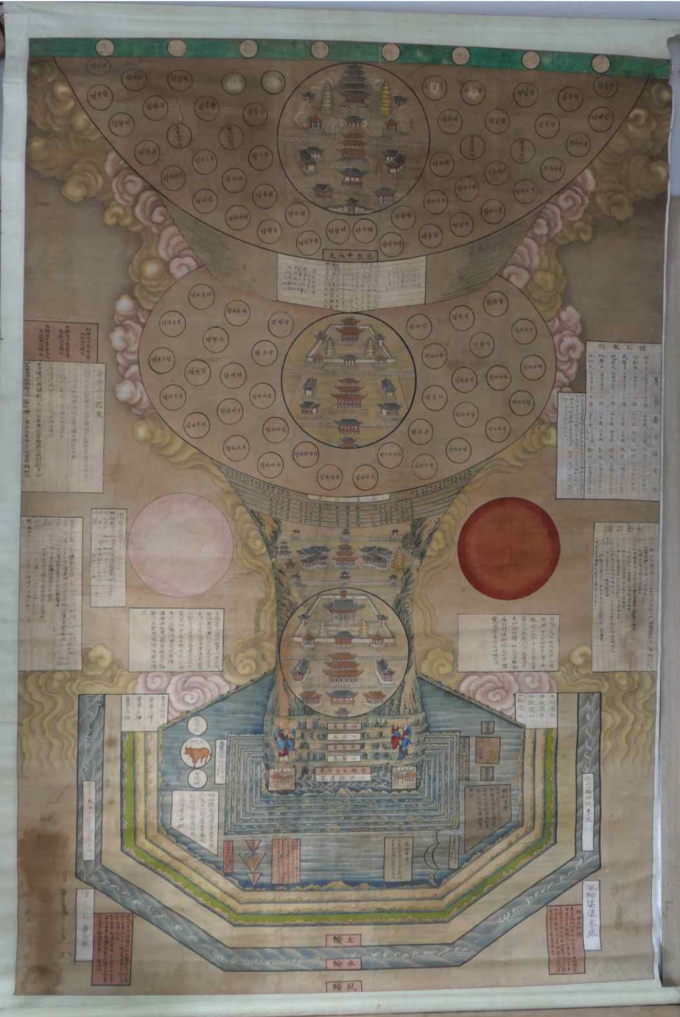매일 한장씩 넘기는 옛 일력은 1938년 7월25일에 멈춰 있다.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날이다. 입학 후 첫 방학을 맞은 한 학생은 고향 북간도로 돌아갈 채비에 분주하다. 책꽂이엔 그가 늘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읽었다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이, 책상엔 시를 써내려간 습작노트가 펼쳐져 있다. 짙어가는 전쟁 분위기 속에서 일제가 금지한 우리말로, 그는 격자무늬 창 옆 책상에 오래 앉아 읽고 썼을 것이다.
학생의 이름은 윤동주(1917∼1945).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에 있는 시인 윤동주의 기숙사 방 풍경이다. 그가 머물렀던 공간을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재현한 것이다. 만 27년2개월이란 짧은 생애에서 연희전문학교를 다닌 4년은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기로 꼽힌다.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등 총 34편의 작품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2월16일 윤동주 80주기를 맞아 그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펴보고자 윤동주기념관을 찾았다.

윤동주기념관은 1922년 지어진 연희전문학교의 기숙사 건물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재단장한 곳으로 윤동주와 당시 학생들이 실제 생활했다. 1층은 전시실, 2층은 도서관, 3층은 열린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1층에는 그의 시와 산문 제목을 딴 7개 전시관이 있다. 윤동주가 나고 자란 고향 북간도 명동촌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소년’ 전시관, 1938년 봄 부푼 꿈을 안고 연희전문학교에 첫발을 디딘 청년 윤동주를 보여주는 ‘새로운 길’ 전시관 등이다. 관련 자료는 전시관마다 자리 잡은 서랍형 전시 가구에 차곡차곡 들어 있다. 삐걱대는 나무 서랍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면 과거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중 일본 유학 시절의 자취를 담은 ‘종시(終始)’ 전시관에서 발걸음이 오래 멎는다. 윤동주는 등단한 적 없는 학생 시인이었으나 생을 마감한 뒤 가족들은 그의 무덤 앞에 ‘시인’ 윤동주라고 새긴 묘비를 세웠다. “나는 종점을 시점으로 바꾼다. 내가 내린 곳이 나의 종점이오. 내가 타는 곳이 나의 시점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쓴 윤동주의 산문 ‘종시’처럼, 생애는 끝났으나 시인으로서의 삶은 시작된 것이다.
윤동주 관련 서적을 모아둔 2층 도서관을 지나 3층에 오르면 과거에 한발 더 가까워진다. 지붕층인 3층에서 윤동주는 입학한 그해 고종사촌 송몽규, 훗날 유고시집을 발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친구 강처중과 함께 생활했다.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놓인 1인용 책상과 의자에 앉아본다. 최미노 학예사는 “윤동주의 기숙사 방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책상을 배치했다”면서 “이곳에 앉으면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윤동주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주는 1941년 졸업을 기념하며 19편의 시를 수록한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글 시집을 출판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라 주변에서 만류했다. 대신 자필로 시집 3부를 제작해 한부는 자신이 갖고 한부는 존경하는 스승 이양하 교수에게, 한부는 가장 가까운 후배 정병욱에게 건넸다.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 정병욱이 전남 광양의 고향집에 맡겨둔 시집만 유일하게 보존됐다. 표지에는 원래 제목이었던 ‘병원’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온통 환자투성이인 세상에서, 윤동주는 자신의 시가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였다고 한다.
1945년 2월16일, 윤동주가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흘렀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시인이 살았던 터전도,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고민하는 이에게 시인의 글귀는 여전히 마음을 두드린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우리의 삶도 저 아름답고도 맑은 시구 앞에서 경건해진다.
◇도움말=‘윤동주 평전’(송우혜·서정시학)
함규원 기자, 사진=백승철 프리랜서 기자,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