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산불 통해 본 문화적 이질감
어디를 가도 우리와는 사정 달라
더 큰 트럼프 충격파에 대비해야
성찰·자기반성 없이는 무용지물
얼마 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다녀왔다. 도착 다음 날 산불 소식을 접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씩 화마가 훑고 지나가는 캘리포니아에 산불은 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고쳐먹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달리는 차량에서 잿빛 연기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을 마주하자 이내 몸은 움츠러들고 공포감이 엄습했다. 하루 전 지났던 말리부 해변의 고급 주택들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행 기간 내내 밤낮없이 비명과도 같은 앰뷸런스와 소방차 사이렌이 이어졌다.
정전도 잇따랐다. 평소에도 캘리포니아는 전력난을 겪는 곳이다. 대형 산불이 도시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물어보나 마나다. 산불이 확산하지 않은 곳까지 수시로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와 쇼핑몰까지 한꺼번에 문을 닫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백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적지 않다는 건 문제다. 사설 유치원도 예외가 아니다. “강풍이 불어 정전이 될지도 모른다”며 일방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따져 묻지만, 답변을 거부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유치원이 문 닫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유치원 이용료를 할인해 주지도 않는다. 오직 인내심만으로 버텨내야 한다. 주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한전 고객센터는 기본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성토가 이어졌을 것이다.

LA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건조와 가뭄, 돌발적인 강풍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산불의 기세가 일부 꺾이고 나서는 송전선로 노후화에 따른 스파크와 방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LA에 사는 한 지인은 “숯불 점화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서 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쯤 되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심 일대를 제외하고는 CCTV 카메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질서 유지보다 개인 인권이 우선해서다. 대신 위성으로 추적한다고 했다. 어디를 가나 CCTV가 작동 중인 우리와는 사정이 꽤 다르다. 세계 최강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미국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교통범칙금에다 범죄로 도로를 함부로 거닐 수 없는 상황까지, 대부분 문화적인 차이로 치부된다. 그중에서도 유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대형 종이 박스를 제외하곤 모든 쓰레기를 함께 그냥 버린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놀라기 일쑤다. 따라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은 못내 켕긴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일상이 된 우리 현실과는 괴리가 큰 탓이다.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도 어렵다. 흥정거리는 더더욱 아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지만 이질감 해소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며 위로하는 선에서 상실감을 메울 수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우리가 더는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는 결별을 예고한 것이다. 높은 관세 장벽과 값비싼 방위비로 둘러싸인 새로운 미국과 맞닥뜨릴 게 분명하다. 문화적 이질감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남북이 나뉜 나라에서 다시 좌우로 나뉘고, 반목하며 세대가 치열하게 쟁투 중인 게 우리다. 설상가상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으로 나라는 절체절명이다. 동맹은 뒤로한 채 오로지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트럼프와 누가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기본이다. 하나 불화의 시대, 성찰과 자기반성 없이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위정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싶다.
박병진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SG칼럼]'LA산불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시대의 경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news-p.v1.20250122.fc29cda5970f4b3286f568788374f051_P2.jpg)



![[여명] 트럼프 2.0 시대와 ‘식탁의 위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4IMYJB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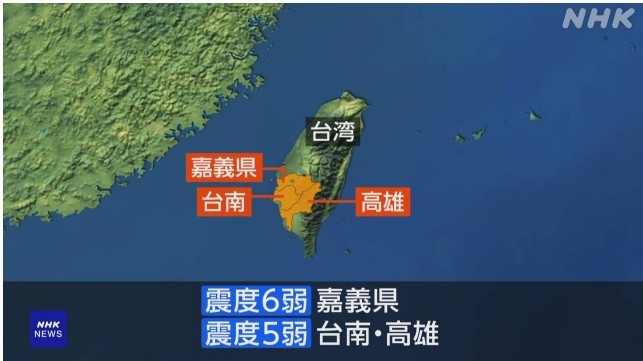
![[K-경제,최대리스크는 정치] 격해지는 헌재 앞 우파 시위... 관광객·주민·자영업자 모두 '울상'](https://www.greened.kr/news/photo/202501/322459_366050_4636.png)
